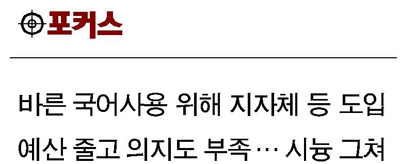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국어책임관 제도’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시행 10년째 겉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당자들조차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호소한다. 대전시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국어책임관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도입됐다.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의 문화예술과나 홍보기획과에서 겸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 역시 잘못된 행정용어를 순화하거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등을 위해 국어책임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에 강제성이 없는데다 지자체 인사 때마다 국어책임관을 맡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시에서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는 담당자 역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어책임관 제도가 시행자체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지만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몇백만 원가량의 시비로 국어책임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시는 국어책임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남대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은 적은 예산과 공무원조차 모르는 ‘깜깜이’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국어책임관은 “국어책임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하는 것이 없는 실정”이라며 “결혼이주민 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실 개최 실적 파악이 고작”이라고 푸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어책임관 제도 자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부가적인 업무로 담당하다 보니 담당자들 역시 책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한글사랑에 대한 의식 고취만큼 지원과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