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노인 나이 상향 논의 본격화
1981년 기대수명 66세서 약 20세 증가
노인 나이 인식 71세 등 가치관도 변화
초고령사회 재정 부담 큰 만큼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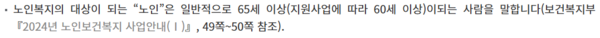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이제 찬반의 문제를 넘어섰다. 시대의 변화상을 현실 제도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 정부의 노인복지 재정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사회적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긴 만큼 이 같은 변화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거다. 다만 노인 관련 사회·경제적 제도들이 오랜 기간 유지된 탓에 굳어진 관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연령 상향에 앞서 선행적으로 논의돼야 할 이슈와 문제는 무엇인지,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제시되는지 살펴본다.
40여 년간 깨지지 않았던 노인 연령이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행법상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 기대수명 증가.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담겼는데 이 중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 노인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등이 꼽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노인 연령 기준은 44년 전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경로우대, 생업지원 등의 조항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당시 기대수명이 66.7세였던 영향인데 현재 노인 기대수명은 83.5세로 약 20세 상승했다. 어찌 보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기대수명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4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경로우대 대상과 사회보험, 고령층 복지제도 혜택 대상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의 나이는 70세 이상이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1만 1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노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보다 1.1세 증가했다. 전체 응답 노인의 79.1%가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대수명이 늘고 사회적 인식이 변하는 동안 노인연령 기준 조정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지난 2015년 이심 전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노인빈곤율 심화 우려로 흐지부지됐다. 이후 2019년에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향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으나 돌아온 반응은 매한가지였다.
진척을 보지 못한 논의가 긴 시간이 지나 본격화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노인 비중이 7.3%에 이르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2008년 10%였던 고령인구 비율이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2017년 14.2%를 기록, 고령사회를 맞이했고 고령사회 진입 7년 만인 지난해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가 됐다. 주요국인 일본이 1970년 7%에서 1994년 14%로 7%포인트 상승하는데 24년 걸렸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찾아왔다. 초고령사회에 저출산이 겹치며 나라빚과 미래세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이제 찬반양론 문제가 아닌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