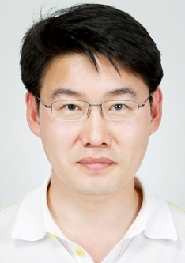
감정에 관하여 연재형식으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려니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난다. 불안함과 설레임이다. 불안함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누구한테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 때문이다. 설레임은 독자들과 같이 실핏줄과 같은 수많은 감정의 지류들과 본류를 찾아서 감정의 지도를 만들고 싶다는 강한 희망 때문이다. 불안함과 설레임이라는 양가적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좀 떨리기도 하다. 떨림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는 오는 감정의 한 형식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감정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소크라테스, 그 다음은 로마교황청에서 한참 떨어진 중세의 한 오지마을의 고집 센 신부가 우리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감정이란 말은 한마디로 금기(禁忌)어였다. 감정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자 악마의 교묘한 장난질이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론적 인간의 전형이며 인간 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가슴을 누르고 머리를 키울 것을 역설하며 감성을 키우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호모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기 일쑤였다. 중세의 오지마을의 고집 센 그 신부도 일요일 미사에서 감정을 정화하고 신앙이성을 갈고 닦는 것이 신을 축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론했을 것이다.
적어도 18세기까지 감정은 인간의 인간됨을 방해하는 적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낭만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개념과 문화가 등장하기 이전에 말이다. 감정의 원초적 형식인 욕망을 찬양하는 키레네학파 이래로 감정을 말해온 생각의 집단들이 있어 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늘 ‘변방적’이라는 딱지표를 달고 있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생각은 ‘이성의 결핍’을 말해주는 단서이자 밀의 표현을 빌리면 ‘돼지의 철학’으로 낙인찍혔다.
쇼펜하우어, 니체, 프로이트의 등장과 함께 이성의 시대는 서서히 종막을 고하고 ‘이성적 동물로서 인간’은 퇴물취급을 받게 된다. 니체가 그것을 과감히 선언했다. 그는 소리 높여 누구나 자기창조의 존재로서 초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설파하는데 그 초인이란 다름 아닌 열정과 자기도취에 빠진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다. 이 새로운 인간유형은 아폴론적인 인간(논리적, 이성적 인간)을 눕히고 안고가면서 감정의 극점에 의지해 자기를 고양시키는 인간이다.
이성적 동물의 죽음을 선언한 니체가 죽은 후 110여년이 넘은 오늘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아마도 대중적인 차원에서 감정지
(emotional intelligence) 혹은 EQ 바람을 일으킨 골먼(Goleman) 때문일 것이다.
그는 감정이 단순히 학습에서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킨 인물이다. 한 때 불었던 국내의 EQ 키우기 열풍은 IQ보다 EQ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생각들에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며 이성보다 감정이 인간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들이 깔려있다. 수많은 심리학 실험들도 ‘인간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동물이다’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만든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큰 사거리마다 OO 심리상담, OO 심리치료소들을 쉽게 발견한다. 이는 심리치료 산업이 우리 집 근처까지 발을 뻗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리의 뿌리에 해당되는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일의 수요증가가 산업화의 양상을 띠게 만든다.
‘현대인은 누구나 고독한 군중으로 섬처럼 살아가고 우울증을 얼마간 다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더 이상 큰 공명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생활에서 경험하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한 때 고약한 마음의 병으로 취급받던 감정의 병이 정상적 삶의 한 요소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감정의 병리와 감정의 정상성이라는 경계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러 이유로 많은 학문분과에서 감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감정치료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교육용만이 아니라 상업형 감정코칭이 번성하고 문학치료, 철학치료도 상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정신분석학에서 시작해 과학적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좁은 틀에 갇혀 있던 ‘감정’이 감정인문학이나 감정사회학 등으로 계속 분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감정이 문제되는 시대, 감정 시대이다.
그러나 감정의 시대에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이런 말을 한다.
감정의 본성과 그 힘에 관하여, 또 감정을 제어할 때 정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아무도 없다
이론의 여지가 있는 말이지만, 그의 말을 빌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나의 감정의 기원과 발생과정, 그것의 본성 그리고 내 삶에서의 역할에 대해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않다.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종교인들이나 상업화된 마음 장사꾼들도 그들의 마음의 기저에 흐르는 감정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알아도 스스로 눈감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의 노력은 감정의 원초적 형식인 욕망의 고차적인 표현이기도하고 과시적 금욕을 설파하면서 기대하는 명예욕의 표현이기도 하다.
스피노자처럼 작업하듯이 매순간 느끼는 감정의 본성을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천 갈래 만 갈래의 감정의 지류를 탐험하고 읽어내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감정의 지도를 만든다면 우리는 자기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감정은 자기이해의 열쇠가 된다. 또한 감정은 사회와 세계를 읽어내는 열쇠이기도 하다.
유색인종에 대한 깊은 혐오, 적대적 지역감정, 민족감정, 종교적 광신이 만든 원시적 증오 등의 키워드를 통해 우리는 사회와 역사를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 수치심의 발생을 추적하면서 한 사회의 문화사를 훑어 낼 수도 있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감정을 영향관계 이해하는 것은 사회이해와 세계이해의 열쇠를 갖는 것과 같다.
자기이해, 사회이해, 세계이해의 열쇠로서 감정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나무만이 아니라 숲을 봐야한다. 숲을 보는 방식은 철학자들, 사회학자들, 신경학자들, 문화학자들, 심리학자들 등이 말하는 수많은 감정에 대한 생각들을 들추어 보면서 동시에 나의 감정의 기원과 흐름, 갈래들의 모양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에 관한 생각의 탐험가와 내 감정의 지질학자, 지형학자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지도’를 손에 얻게 될 것이다.
-이하준 한남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