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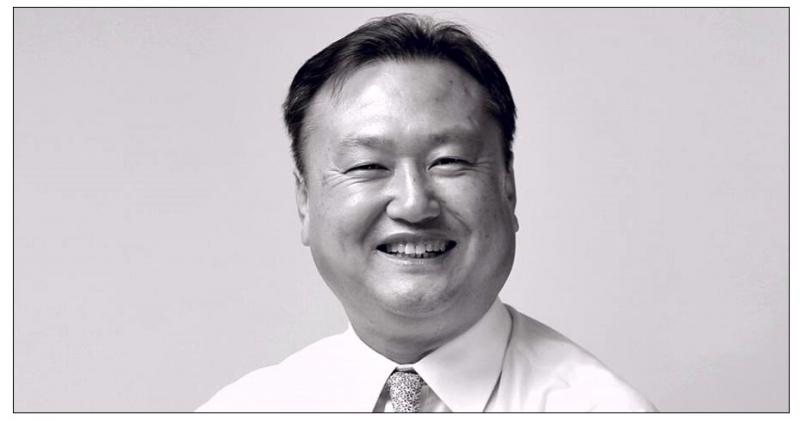
2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 결사항전을 부르짖던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한다. 그리고는 한 달 남짓의 시간이 흐른 9월 12일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이던 노부유키(阿部信行)가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저주 섞인 한 마디를 던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가 남긴 말을 몇 번 되새겨 읽어보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낀다. 그가 말한 대로 우리가 놀아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패했다고 해서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지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은 서로 이간질 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일제가 식민지 우민화 교육을 자행했음을 시인한 말이다.
그렇다면 일제가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시행한 식민지 우민화교육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주적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는 수동적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의미한다. 일제는 강점기 내내 우리 민족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존재감을 정확히 인지하는 교육을 철저히 배제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언제라도 몸을 바쳐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황국식민으로 만드는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었다. 개성은 철저하게 말살되었다.
한 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식민교육의 잔재는 전체주의로 표출된다. 개성은 뒷전인 채 언제나 전체만을 강조하는 문화는 한국사회 곳곳에 여전하다. 전체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못해 적으로 간주한다. 80년대 말 일제잔재인 교복문화를 어렵게 퇴출시켰지만 전체주의 사고로 무장된 기성세대는 교복을 부활시켰다. 전체주의가 머리에 박혀 통일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목동이 몇 마리 개를 동원해 수천 마리의 양을 몰듯이 통제와 규제 속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형태의 통치스타일을 선호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전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묵인하는 군사독재시절의 공포정치를 그리워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면 불안해하고 결정 내리지 못하며 누군가가 나를 통제해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이는 모두 일제가 세뇌시킨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군대나 교도소에 가까웠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획일성과 통일성만 강조하며 사회에서 써먹기 좋은 조련된 인력을 찍어내듯 배출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학교에는 늘 폭력이 난무했고, 무엇이든 서열화가 일상이 되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서열화 되고, 주먹으로 서열화 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같은 옷을 입은 전교생이 행진곡에 맞춰 운동장을 사열하며 발 맞춰 행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다.
전 세계 많은 국가 중 운동장에 높은 조회대를 설치해, 그곳에서 한 명이 마이크 음성과 호루라기 소리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집단 통제하는 형태의 교육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일제의 전체주의 망령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순응형 인간으로 길들여져야 명문대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생시절은 즐겁고 행복하면 안 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인내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모들의 의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다. 아이들은 지금의 행복이 훗날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어른들의 엄포에 잔뜩 겁을 먹은 채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주적이고 깊은 사고를 하는 인간이 아닌 길들여져 순응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식민교육의 영향이다. 3·1운동 100주년인 해를 맞아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본다. 식민문화의 잔재인 전체주의를 털어낼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전환해 아이들에게 자주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대한독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