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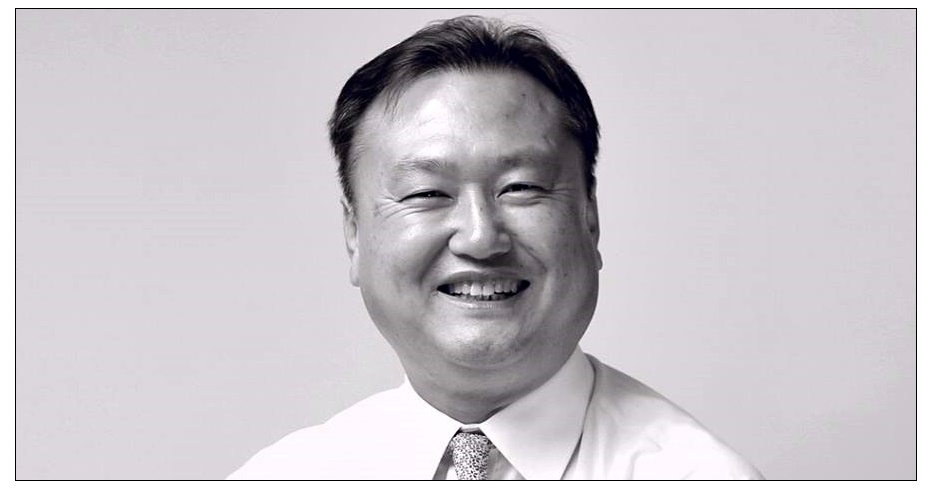
시골에 가면 유난히 동면, 서면, 남면, 북면이 많다. 남일면, 남이면도 많고 북일면, 북이면도 많다. 동일면, 동이면도 있고, 서일면 서이면도 있다.
이뿐 아니라 군청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군동면, 군서면, 군남면, 군북면이라는 이름도 많다. 이들 외에도 홍성 동쪽에 있다 하여 홍동면, 홍성 북쪽에 있다하여 홍북면 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이름이 참으로 많다. 이 같은 지명은 대부분 일제가 1914년 창지개명(創地改名)을 단행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앞서 1896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부(府)·군(郡)·면(面)으로 나눴지만 일제가 이를 1914년에 다시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창지개명을 단행했고, 이때 동서남북 방위명을 딴 지명이 쏟아졌다. 시골에 동서남북이 들어간 지명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14년에 창지개명을 했다고 하니 벌써 105년의 세월이 흘렀다. 100년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들 지명은 너무도 익숙해져 불편한 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도 없다. ‘남쪽에 위치해서 남면인가보다’라고는 생각할지 몰라도 누가, 언제, 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던 중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전국 곳곳에서 창지개명 때 바뀐 일제식 이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이름을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대구, 경북 칠곡과 구미, 경남 창원, 강원 강릉과 정선, 전남 화순 등이 그 대표적 지역들이다.
화순군의 경우 행정구역 명칭 변경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해 압도적 표 차이로 찬성표를 얻어 북면을 백아면, 남면을 사평면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정성군도 동면을 화암면, 북면을 어량면으로 변경했다. 영월군도 서면을 한반도면,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바꿨다. 지역 행정구역명을 바꾸려면 주민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참여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 조례개정을 거쳐 시·도 또는 시·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통해 변경이 확정된다. 과감히 개명 결단을 내린 지역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대도시 지역의 행정구 이름도 유난히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많다. 동남구, 서북구도 있다. 이들 행정구는 일제와 무관한 시기에 생겨났지만 일제식 방위지명을 사용했다. 대전의 경우도 5개 구 가운데 3개 구의 명칭이 중구, 동구, 서구이다. 당초 행정구 이름을 정할 때 별 생각 없이 방위대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때 보문구, 둔산구, 대동구 등으로 개명하자는 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냥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커 개명 움직임은 무위로 끝났다. 허구 많은 이름 중에 일본식 동서남북 지명을 사용한 것도 못마땅하고, 그걸 고치자는데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도 못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주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모아 개성 없고, 일본 냄새가 물씬 나는 동서남북 지명의 행정구 명칭을 세련되고 자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제가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굳이 새로 짓는 행정구 명칭을 일본식으로 지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전국 각지에서 일본식 지명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 유독 충청권만 그런 움직임이 없거나 소극적이라는 사실도 안타깝다. 비단 동서남북 방위지명뿐 아니라 일본식 지명은 차고 넘친다. 지명학자들에 따르면 국내 지명의 30% 가까이가 일제 때 일본식으로 지은 것이라 한다. 지명뿐 아니라 산이나 물 이름도 일제 때 창지개명 하면서 바뀐 경우가 허다하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지명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학계와 손잡고 설득작업을 벌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고장의 이름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기 바란다.
김도운 논설위원
8205@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