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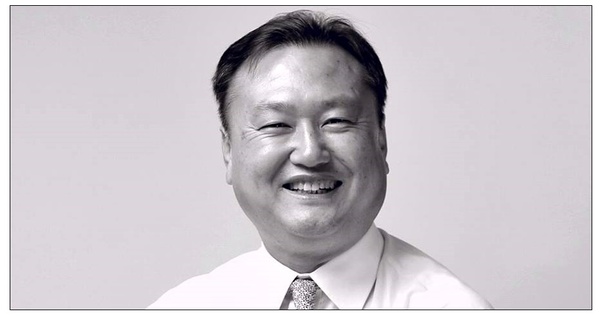
[금강일보 김도운 논설위원 기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손 대면 화약고로 돌변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학 입시정책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불평등으로 가득하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의 불만이 누적돼 있다. 실상 입시제도와 부동산 제도는 기득권층에게 최적화돼 있어 누구에게나 공평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하지만 그런 여론과는 달리 막상 개혁하겠다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발표하면 마치 화약고를 건드린 양 요란한 폭발음을 내며 여론이 들끓는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도 이 두 가지 정책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어줍게 손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뒷걸음질하거나, 애초 계획한 만큼의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용두사미 꼴이 되기에 십상이었다. 기득권자들은 막강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민첩하게 대처해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킨다. 문재인 정부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론의 멍석말이만 당하고 말았다. 대입제도의 경우 정시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어처구니없는 뒷걸음질을 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도 규제를 강화하는 강수로 맞섰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내가 아는 한 노인은 자녀 둘이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들은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았다. 그 노인을 아는 지인이 그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때 “이분 자녀가 둘 다 서울대학 졸업했어요.”라고 한다. 그 노인의 자녀 출신학교에 대해 알 필요가 없는 관계인 이에게도 그렇게 소개한다. 적어도 내가 지켜본 그에 대한 소개 장면은 거의 그러했다. 두 자녀의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등등은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 오로지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란 사실만 전한다. 실로 대단한 서울대학교의 힘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엘리트 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대전으로 낙향했다. 그 또한 제삼자에게 소개받을 때 늘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기업 핵심부서에서 근무하던 분입니다.”라고 소개한다. 덧붙여 “대전에 살기에 아까운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 대전에 살기 아깝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논리에 수긍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에 모두가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동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대전사람들끼리 만나서 소개하는 모습을 볼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지역 내에서 손꼽는 고가의 아파트 단지나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 “이분이 ○○단지 살아요. 거기가 평당 000만 원 하는 거 아시죠?”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신개발지 ○○동에 몇천 평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라고 소개하는 예도 많이 경험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보편적으로 자랑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출신학교 특히 대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그 중에도 부동산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 진실성, 대인관계 등은 나중 얘기다. 우선은 학벌과 재산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인에게 학벌과 재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정착돼 있다. 그러니 그 두 가지와 직결되는 입시제도나 부동산 제도를 바꾸려는 정책이 발표되면 온 나라가 벌집이 되는 것이다.
‘잘산다’는 개념은 포괄적이지만 축약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러나 상당수 한국인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삶을 잘산다고 표현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벌 지상주의도 따지고 보면 고학력과 명문대 학벌이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비롯된 갈구이다. 다수의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늘 제자리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