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목표치 초과달성 했지만
감축량 83% 폐기물 분야 집중
시민참여 기여 6.8%에 머물러
사회적 참여기반 취약 등 한계
지속가능한 구조적 전환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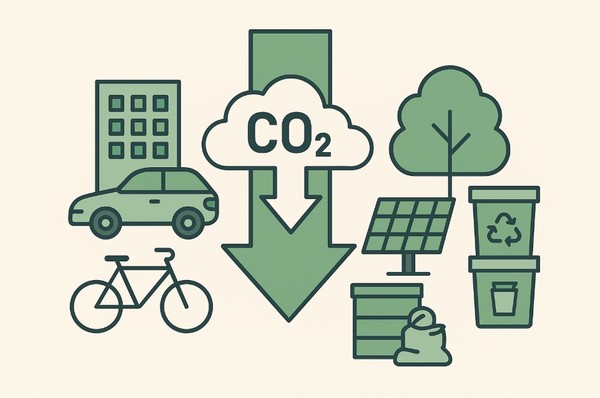
대전시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계획치를 넘어섰지만 구조적 전환이라는 본래의 방향성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이 줄었고 누가 줄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한 감축 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남은 과제로 제기된다.
시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요 분야에서 35만 4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세운 목표치인 34만 5000톤 대비 103%를 달성한 건데 이는 20년생 나무 약 50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다.
성과의 핵심은 폐기물 분야였다. 전체 감축량의 83%에 해당하는 약 29만 4000톤이 이 부문에서 나왔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바이오가스 회수·재활용과 매립가스 처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다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 일정 수준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소형 햇빛발전소, 승용차 요일제, 공영자전거 타슈, 다회용컵 사용 등 10여 개 사업을 통해 약 2만 4256톤을 감축했다. 이는 전체 감축량의 약 6.8%에 해당한다. 이 중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약 10만 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1만 7006톤을 줄였고 소형 햇빛발전소 230곳을 설치해 5554톤, 차량 감축 관련 포인트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통해 각각 1356톤과 297톤을 감축했다. 공공자전거 타슈는 2톤으로 집계됐다.
다만 감축의 내용과 구조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한계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감축량의 83%가 폐기물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설비 기반의 기술적 처리에 의존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생활양식이나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줄이긴 했지만 ‘어떻게 줄였는가’라는 질문에서 보면 사실상 이번 성과는 시작점에 가까운 셈이다.
시민 참여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감축량은 전체의 6.8%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포인트제 등 간접적 방식이다.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면 시민 참여가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일류녹색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설 및 대체 사업 발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