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중국산동사범대학 한국학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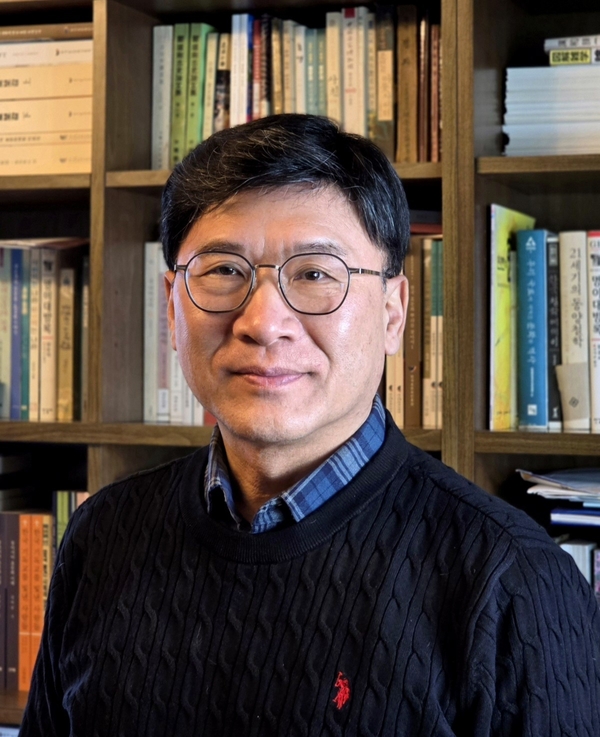
중국 사람들이 본 한국의 산하는 매우 신기한 모습이다. 얼마 전 고향과 일터가 모두 산동성인 몇몇 교수들과 세종에서 서울까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한여름 짙푸른 산하를 바라보며 “와~!” 하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내게는 익숙한 자연환경이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신기한 모습이었나 보다. 산동성은 바닷가 일부 지역과 내륙의 태산산맥이 있는 주변이 아니고서는 대개가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대평원지대이다. 이런 곳에 살던 이들에게 산이 유난히 많은 한국의 자연환경은 매우 신기한 모습이었던 같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교수도 매번 올 때마다 같은 생각과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고대 중국문화의 중심지대였던 산동성이나 하남성을 여행을 하다보면 끝도 없는 대평원이 볼거리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상공에서 내려다본 이들 지역의 모습은 한마디로 매우 반듯한 평지에 마을과 도로가 곧게 나 있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옛날 정치지도자들이 우물 정(井)자로 땅을 9등분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는 정전제 사회가 절로 연상된다. 인위적 토지 구획이 필요 없는 이런 환경에서 정전제는 어렵지 않게 구현 가능했을 것이다. 농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집들도 곳곳에 가지런히 놓여있으니 50호, 100호 등을 기준으로 나눠서 지역을 관리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했을 것 같다. 평원지대를 가로지르는 도로 역시도 자로 잰 듯 시원시원하다.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지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산과 구릉지가 많은 곳에 살던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며 역시 신기해하며 “와~!”하고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두 나라는 전혀 다른 자연환경에서 살아왔지만 농경문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교문화 속에서 두 나라는 지식인 다음으로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 말해왔다. 그러면서도 양국은 자연환경의 차이에 따른 독특한 문화를 각기 이루며 살아왔다. 논과 밭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중국(특히 산동성과 하남성)의 드넓은 평원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주로 밭이고 우리식의 논이 없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한국은 넓은 평원이 아닌 작은 척박한 공간이라도 논농사 중심의 농경문화를 이루며 살아왔다면 중국은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 대부분을 밭농사 중심으로 일구며 살아왔던 것이다. 한국은 쌀이 중심이고 중국은 밀과 옥수수가 대종을 이루는 농경구조의 차이다. 두 나라가 같은 농경문화이지만 논 중심의 한국과 밭 중심의 중국으로 갈리면서, 그에 따른 글자도 달리 사용했다.
한자는 특성상 뜻글자이다 보니 환경에 맞는 글자가 그때그때 필요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글자들이 나왔다. 예컨대 현대사회 온갖 종류의 카드가 일반화되는 과정 속에서 전에 없던 카드란 글자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긁는다는 의미의 上下를 합친 카(卡)자가 나왔다. 그런데 밭농사가 중심이고 논이 드물었던 중국에서는 논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서 ‘물이 있는 밭’이란 뜻의 ‘수전(水田)’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로 이루어졌으니 한 글자에 뜻을 담고 있는 한자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논농사 중심의 한국에서는 ‘밭 위에 물이 있다’는 의미의 ‘논 답(畓)’이란 글자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했다. 중국에 없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또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논을 ‘밭 전(田)’, 밭을 화(火)와 전(田)을 합쳐 쓴 ‘전(畑)’이라 했다. 산간에서 화전으로 일군 것이 밭이고, 평지에 있는 밭을 논으로 사용한 까닭이 아닐까 생각한다. 같은 한자문화권이지만 뜻글자인 한자의 특성상 각기 지형에 맞게 한자가 변형되거나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리글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말을 만들 수 있지만, 뜻글자 한자는 그에 맞는 글자를 새롭게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