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중국산동사범대학 한국학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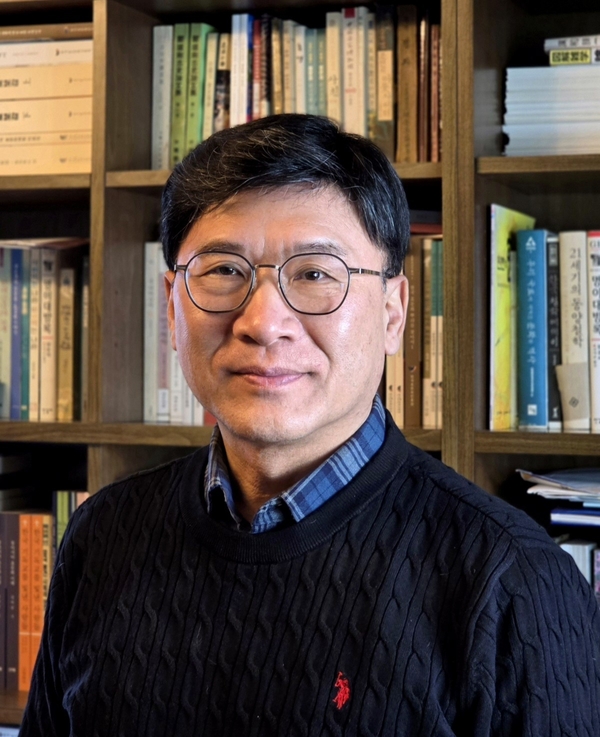
중국의 유교문화 복원과 선양의 흐름이 무섭도록 대담하다. 지난 8월 공자의 고향 산동성 곡부에서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와 학자 2000여 명이 참석한 니산논단이 있었고 10월엔 주자의 고향 복건성 남평(무이산)에서 세계 정치지도자와 학자가 참여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공자와 주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당대는 물론 역사 속의 굴곡진 인생역정이라 할 수 있다.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일원화하는 가운데 도덕과 다양성을 존중하던 유가를 척결하려고 했던 분서갱유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법가 중심의 일원적 통치 질서를 추구하는데 정전제와 같은 분권정치를 주장하는 유가는 눈에 가시였다. 법가적 패권정치에 유가의 도덕정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주자학도 주자의 의도와는 달리 교조적 정치 이론으로 활용되면서 큰 난관에 부딪혔다. 한동안 ‘리(理)가 사람을 죽인다(以理殺人)’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주자학은 비판 척결의 대상이 됐다. 공자의 인학(仁學)과 주자의 이학(理學)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시련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시련의 극점은 현대사회 문화대혁명시절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혁의 중심에 유교문화 척결이 있었고 또 그 중심에 공자와 주자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공자와 주자의 고향을 방문, 이들의 학문과 사상을 중국이 창의적으로 계승해야할 가장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가치관이라 지목하면서 중앙정부와 해당 성정부가 주관하는 대형국제학술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전 관련 행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유학전공자 중심의 한정된 학술대회였고 참석자도 한중일 유교문화권과 미국, 유럽의 일부 전문가에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범세계적 학술대회로 격을 달리하며 동남아와 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의 전현직 대통령, 부통령, 총리 등 최고위층 지도자들까지 참석, 유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아마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학문·사상적 확대 적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대형 국제학술대회의 이면에는 다양성을 존중했던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주자의 ‘이일분수(理一分殊)’ 이론이 작용한다. 공자의 인학과 주자의 이학이 다종다양한 현대사회에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 다양성 존중의 이면에는 공자와 주자의 학문적 공통점인 집대성(集大成)이란 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공자를 유교의 창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공자는 창시자가 아니라 기존의 유교이론을 한데 모은 집대성자이다. 선비의 학문 유학(儒學), 선비의 가르침 유교(儒敎), 선비들의 모임 유가(儒家)의 다양한 이론들을 집대성한 이가 바로 공자다. 주자도 공자 및 그 전후 유학의 다양한 이론을 담고 있는 경전들의 해석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했으니 그 역시도 집대성자이다. 그래서 공자를 모신 사당을 대성전(大成殿), 주자를 모신 사당을 집성전(集成殿)이라 한다.
이런 중국의 대학자이자 사상가 공자와 주자의 학문을 조선사회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사상가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우암 송시열이다. 워낙 송시열의 역할과 영향력이 컸기에 조선에서는 그를 송자(宋子)라 존칭했다. 성씨 뒤에 자(子)를 붙인 것은 ‘선생님 중 선생님’이란 뜻이니 아무나 붙이는 경칭이 아니라 역사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고려한 호칭이다. 따라서 자를 붙인 자체가 극존칭이니만큼 공자를 공자님이라 말함은 자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송자는 공자의 인학과 주자의 이학을 정통으로 수용하고 이를 도학(道學)으로 계승한 학자다. 공자-맹자-주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존중하며 도통론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산동성과 복건성에서 공자의 인학과 주자의 이학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적 행사로 계승하고 있듯, 대전을 너머 충청 지역에서도 송자의 도학을 유학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종합적인 검토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