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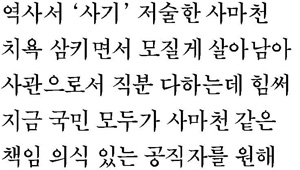
구우일모(九牛一毛)란 글자 그대로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터럭 한 개’라는 뜻으로 많은 것들 중 극히 작은 한 개, 즉 ‘대단한 것이 못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을 처음 쓴 인물은 2160년 전 중국 한무제(漢武帝) 때의 유명한 사가(史家)였던 사마천(司馬遷)이다. 그는 억울하게 형장(刑場)으로 끌려가면서 친구인 임안(任安)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을 ‘구우일모’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소털 한 개에 비유한 그가 사기(史記) 본기 12권, 표(表) 10권, 서(書) 8권, 세가(世家) 30권, 열전(列傳) 70권 등 도합 130권의 저서를 세상에 남기고 갔다는 점이다.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사마천이 남성의 상징인 생식기를 궁형(宮刑)으로 잃었다는 것인데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무제 때 명장 가운데 이릉(李陵)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흉노를 두려움에 떨게 해 ‘비장군(飛將軍)’으로 불리던 이광(李廣) 장군의 손자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무인 중의 무인이었다. 이릉은 보병 5000명을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나가 고군분투 했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인해 패하고 말았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이릉 역시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이릉이 흉노에게 투항해 우교왕(右校王)이 돼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졌고, 무제는 이릉의 비애국적인 행위에 격분해 그의 일족을 죽이려고 했다. 이에 조정의 대신이나 이릉의 옛 친구들은 격노하는 무제를 두려워해 그를 변호할 생각조차 못하고 무제의 안색만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사관(史官)이었던 사마천만은 이릉을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릉의 무고함을 변호하기 위해 무제 앞으로 나갔다.
“이릉은 적은 병력으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만 원군(援軍)이 도착하지 않고 우리 병사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어 패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병사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명장입니다. 지금 그가 흉노에게 투항한 것 또한 훗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얻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일 것입니다. 이릉의 공을 천하에 알리십시오.”
무제는 이릉을 변호하고 나선 사마천 역시 이릉과 똑같은 반역자라며 생식기를 자르는 궁형에 처했다. 이것은 그 당시 형벌 중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이때 사마천의 나이가 48세라고 하니 어찌 그의 젊음이 안타깝지 않은가! 일설에는 38세 때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궁형을 받으러 나갈 때 사마천이 친구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터럭 하나(구우일모·九牛一毛) 없어진 것과 같다”라는 편지를 써 땅강아지나 개미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가슴 아파했다. 그러면서도 사마천이 치욕스런 삶을 이어갔던 이유는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이 통사(通史)를 기록하라는 유언을 했기 때문이었다. 역사학자였던 아버지가 임종 직전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던 모습이 사마천의 뇌리에 떠올라 죽으려는 그의 마음을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다.
사마천은 2년 형을 마치고 출옥 후 중서령(中書令)의 관직을 맡아 사기(史記) 저술에 힘썼다. 사마천이 받은 치욕의 상처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는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은 자만이 저술에 열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집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아버지가 벼슬길에서 불공정한 굴욕 때문에 분사(憤死)한 그 한과 자신이 받은 정신적 치욕, 육체적 상처를 씹으면서 사마천은 130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왜 이 땅에는 사마천 같은 공직자가 없는 것일까? 그런 공직자가 숨어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찾아서 상을 줘야 하지 않는가? 상을 줄 사람을 좌천시키고, 벌을 줄 사람에게 승진과 상을 주는 일은 과연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지금 ‘국가개조(國家改造)’라는 소리가 높다. 국민은 모두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