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표음식? 지역마다 맛 잔치 하나만 못 고르지!
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자연환경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그 지역의 음식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몽골의 경우 말린 고기와 양 젖을 주식으로 먹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이 정착생활이 아닌 유목생활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주로 해산물을 즐겨 먹었는데 이를 통해선 바다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음식, 혹은 식생활 등을 살피는 것 역시 지역학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평양하면 냉면이 떠오르는 것에 비해 충남하면 양반의 고장 등이 떠오를 뿐 딱히 음식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충남의 음식문화가 내포권, 서해안 섬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방과 강경 및 주변을 연결해 주는 내륙지방으로 나뉘어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의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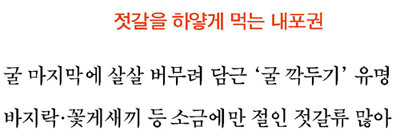
백김치에는 새우젓과 조기젓, 황새기젓을 넣되 멸치젓은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내포지역 등 서해안지역은 대두 생산량이 적어 강경권 등 내륙지방에 비해 간장과 된장은 비교적 지양하는 편으로, 간은 새우젓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치에는 새우젓 등 다양한 젓갈을 사용하는데 이 지역의 젓갈 특징은 바로 원재료를 소금에만 절인다는 것이다. 바지락을 소금에 절인 해피젓, 꽃게보다 작은 게를 소금에 절인 박하지, 꽃게 새끼를 절인 사시랭이젓 등이 내포와 서해안의 대표적인 젓갈들로, 해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참고해서 볼 것이 바로 어리굴젓이다. 어리굴젓은 비교적 하얀색을 띠는 내포권의 젓갈과 다르게 강한 양념이 배어 있는 빨간색으로 돼 있다. 어리굴젓은 당진과 서산에서 주로 먹었는데, 당진은 굴을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를 뿌렸고, 서산은 여기에 서산에서 많이 먹는 조밥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조밥의 경우 서산에서는 누룽지로도 해먹는 등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당진의 어리굴젓과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현재는 젓갈에 소금 외에 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소금에만 절인 전통 젓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 줄어들었다.
해산물이 많이 나면서 젓갈뿐 아니라 식용으로 쓰이는 생선 역시 다양한 편이다.
내포권을 비롯한 해안지방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생선 등 해산물을 섭취했는데 봄에는 중하, 새우, 삼치, 조시, 숭어, 주꾸미를 주로 먹었고, 여름에는 대하와 파래, 가을에는 새우와 전어, 낙지, 준치를 즐겨 먹었다. 겨울에는 굴과 새우를 비롯해 밴댕이, 숭어, 망둥어, 꽃게, 김 등이 주요 섭취원이었다.
제철 생선들은 살짝 말린 다음 쪄서 먹는 자반류 외에 말린 생선으로 쪄서 먹는 건어물찜 등 다양하게 조리해 먹었다.
나머지 생선들은 회로 먹거나 소금간을 해 절임이나 말려서 먹었다. 말려 먹는 생선 중에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명태를 햇볕과 찬바람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검게 된 먹태이다. 먹태는 딱딱해서 국을 끓이기엔 좋지 않고 포 형태로 먹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술로는 면천의 두견주와 아산의 연엽주가 유명하다.
도서지역의 경우 쌀과 대두, 나물이 귀해 고추장도 보리나 밀가루에 소금, 고춧가루, 엿기름을 섞어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음식의 간은 까나리액젓이나 기타 젓국을 간장 대용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해안가 지방에는 깨와 녹두, 팥, 마늘, 고추, 양파, 고구마 등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쪽파나 마늘, 고추 등을 재료로 한 파김치나 마늘쫑 장아찌를 많이 만들어 먹는다. 마늘쫑 장아찌는 간장이 아닌 까나리액젓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젓갈들은 내포권과 마찬가지로 색이 하얀 젓을 많이 먹는데 소라새끼를 절인 무룩젓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는 뱃고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떡의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무르떡과 고물떡 외에 액막이 떡인 수수경단을 자주 만들어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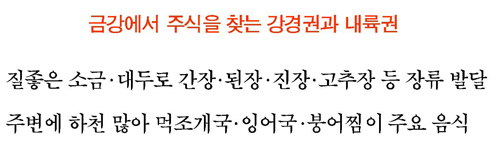
내륙지방은 강경으로부터 금강줄기를 타고 질 좋은 소금과 대두가 어우러져 간장과 된장, 진장, 즙장, 지름장을 포함해 각종 고추장이 발달했다. 때문에 강경권과 내륙권의 젓갈은 내포권과 반대로 빨간 것이 특징이다. 빨간 젓이 아닌 것으로는 간장으로 논의 벼포기에서 잡은 참게를 재료로 해 젓갈을 담아 만든 민물게장이 유명하다.
강경권과 내륙권은 금강과 하천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먹조개(백마강에서 서식하는 조개)로 만든 먹조개국, 잉어로 만든 잉엇국과 잉어회, 붕어로 만든 붕어찜 등이 주요 음식이었다. 북어는 원산에서 들여와 조선 때부터 강경포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태 장아찌가 유명해졌다.
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된 이후로는 인삼을 재료로 하는 잉어찜, 묘삼을 사용한 묘삼나박김치와 묘삼생채도 지역성을 보여주는 음식문화가 됐다.
공주에서는 깍두기를 담을 때 예부터 찹쌀풀과 꿀을 넣었다. 또 찹쌀로 만든 백일주와 송순주, 소국, 국화주가 대표적인 지역 술로 손꼽히고 있다.

서천 한산의 경우 내포권과 강경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내포권에 가까운 편이지만 강경과의 인접성 때문인지 음식문화가 서로 융합돼 있는 편이다. 가령 내포권의 해산물 재료에 강경권의 색이 강한 젓갈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곳에는 무를 크게 썰어 담은 섞박지 김치가 유명한데 처음에는 조기젓과 황새기젓, 새우젓 등 하얀 젓갈을 사용해서 간을 하다 후에는 멸치젓을 사용한다.
한산 소곡주 역시 이를 근거하는 대표적인 술이다. 한산은 내포권이어서 해산물을 주로 한 음식이 주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산은 내포권에서 비교적 많은 기름진 곡창지대여서 곡류의 생산량이 상당했다. 때문에 남해를 넘어 서해에 침입한 왜구들이 서천지역을 항상 일순위로 노렸다. 그만큼 곡류가 많이 생산되는 데 반해 주식은 생선 등이어서 곡류가 넘쳐났고, 이를 술로 담그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곡주이다.
대전권의 음식은 내륙권과 인접해 있어 대체적으로 내륙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한밭 혹은 대전(大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곡류들을 키웠다는 점이다. 특히 먹고살기 힘들어진 후 쌀이 아닌 밀가루가 이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면서 밀가루를 이용한 국수가 비교적 유명한 편이다. 휴게소의 대표적인 음식인 가락국수나 대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칼국수가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여기에 인근 공주의 영향을 받아 칼국수에 고추장을 풀기도 했고, 부여의 먹조개를 가져다 국수에 넣어 먹기도 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참고 ‘충남의 정체성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