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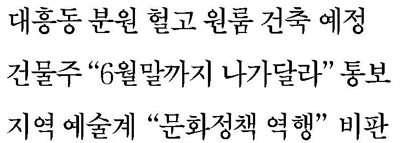
대전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대흥동 분원 전창곤 원장은 최근 건물 주인으로부터 오는 6월까지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협상의 여지도 없이 건물을 원룸으로 짓겠다는 서류까지 보내놓은 상태였다.
전 원장은 “몇 년 동안 이 공간에서 원도심 문화를 만들고, 거리의 성격을 여러 단체들이 함께 문화적으로 조성해놨는데 결국 획일화된 원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스카이로드 등에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문화공간들을 보호해줘야 도시의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서울 홍대의 유명 거리처럼, 문화원과 은행나무 가로수가 어울리는 문화의 거리로 변화시켜갔던 문화원의 위기소식에 지역 문화계는 ‘대전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원로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공동화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대전판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지역이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데 전시행정에만 예산을 쓰고 이러한 작은 공간문화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도 “서울 등 다른 도시에서는 시에서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할 공간을 매입해 단체들에게 월세를 주는 방법으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전의 얼마 남지 않은 근대화 공간이 원룸촌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정책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원 대흥동 분원은 남은 5개월 여 동안 이전장소를 물색할 계획이다. 이미 건물 매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전이 기정사실화돼서다. 원도심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흥동이나 옛 충남도청과 가까운 선화동 인근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전 원장은 “인근 신도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전을 요청해온 곳이 있지만 문화원은 원도심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원도심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알아보고 있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 고민이 많다. 문화공간에 대한 보존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