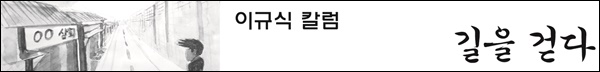
대전 인쇄특화거리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 일대는 이른바 ‘원도심’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일단 적막하고 쇠퇴하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런저런 활성화, 육성책이 시행되지만 대개의 경우 투여된 예산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의 경우 둔산 지역으로 주요기관과 경제활동의 축이 옮겨간 지 30년이 넘었다. 대흥동, 선화동, 중동, 정동, 원동 등 옛 중심지, 번화가에는 어쩔 수 없는 쇠락의 기운이 감돌지만 그 안에 오랜 전통의 맥락, 문화의 숨결은 여전히 뛰놀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집적된 지혜와 경륜이 살아 숨쉬는 원도심을 걸어간다.

대전 중앙로 한밭식당 언저리에서 한밭중학교 부근에 이르는 700~800m 정도 도로 주변에 포진한 대전인쇄특화거리. 모든 것이 대형화하고 자동화하는 추세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듯 정답고 푸근하다. 사람 사는 느낌이 든다. 서울, 대구에 이어 전국 세번째 규모라는데 대략 750개 연관업체, 3000명 안팎의 인력이 장인정신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대 재개발, 재건축 추세에 따라 넓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 현대화된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간의 견해차이, 셈법상의 이견으로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 정부청사에서 나오는 일감을 모두 수용 못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아쉬운 현실에서 대전인쇄특화거리의 과감한 현대화 작업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가 급속히 진전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 책을 찾는다. 지난 해 이후 코로나로 인한 치명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생활습관 때문인지 출판산업은 소폭 상승을 이루었다고 한다. 바라기는 인쇄특화거리가 IT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작업시스템이 현대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첨단체제로 바뀌기 바란다. 그러면서도 인쇄골목이라는 정다운 이름처럼 활자, 종이, 책이 주는 여유, 사람 사는 냄새를 여전히 간직하면서 도시의 열기와 삭막함을 식혀주는 문화특구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한남대 프랑스어문학전공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