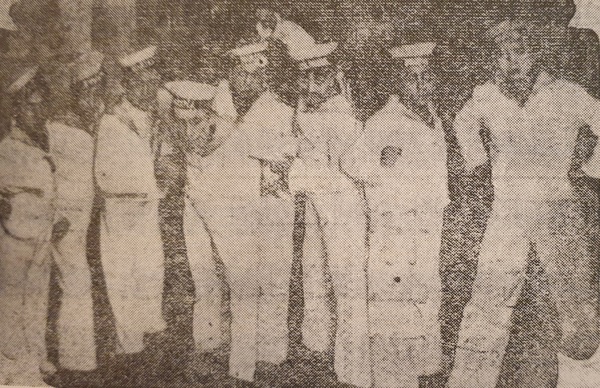
[금강일보] 2020학년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른 연배에 비하여 대학생활에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2년제 대학을 마치고 다음 달 졸업하는 경우 강의는 물론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코로나 시국에서 뚜렷하고 인상적인 추억이나 기억할 만한 경험이 적은 탓에 더욱 그러하겠다. 많은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대면수업에서도 여러 정황상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공과 교양과목 등 강의 수강이 대학생활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교수, 선후배와의 만남 그리고 학과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성취하는 유무형의 자산 역시 중요하다. 규정된 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차원의 자율적 활동이 2년간 거의 원천봉쇄 되다시피 하여 인간관계 형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자율적 활동을 통한 성장 등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대학문을 나서게 된다.
2000년대 이후 특히 침체된 대학문화는 바로 ‘취업’이라는 절체절명의 대전제 아래 무력해지고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학술제, 축제, 졸업여행, 사은회, MT, 졸업앨범 촬영 등 오랜 세월 대학생들의 의식과 유대감, 비전을 키워주었던 여러 활동들이 취업 그리고 이즈음 코로나의 위세로 형해화되고 있다. 70세가 넘어 만학의 꿈을 키우며 대학문을 두드리는 고령의 대학생들도 ‘취업대상자’에 포함되어 이들이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학과별 취업률을 잠식하게 되는 교육부의 경직된 지침과 대학현실 앞에 모두들 굳어지고 초조하며 긴장된 대학생활을 보낼 수 밖에 없다.
특히 1970년대까지 ‘서클’로 불리던 ‘동아리’ 활동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제2의 전공으로 학과생활에서 얻지 못한 넓은 경험과 인식, 감각을 키우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동아리 활동의 소득을 평생의 직업으로 연결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숱한 원로, 중진, 중견 예술인들이 대학시절 서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적성을 재발견, 전공과 무관한 그 길로 정진해온 사례도 많이 보고있다.
점차 초토화되는 대학 동아리의 척박한 현실에서 작년 가을 ‘고려대학교 연극 백년사(1918-2017)’라는 1000쪽이 넘는 책자를 펴낸 고려대학교 연극동아리 ’고려대학교 극예술연구회’의 오랜 활동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제강점기 신극의 태동과 같은 시기에 청년 소인극(素人劇)으로 출발하여 연극, 청년문화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우리나라 공연예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온 점에서 대학동아리 활동이 이룰 수 있는 성취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학동아리가 대학시절 스쳐지나가는 추억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외연을 넓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선례로 꼽힌다. ‘취업’과 특히 이즈음 코로나의 위협으로 시들어 가는 대학문화, 동아리 문화의 소생은 우리 사회 문화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남대 프랑스어문학전공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