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 교수

돈(money, 貨幣, 金錢)은 우리 삶 속의 대표적인 유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돈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으로 그 역사는 매우 길다. 돈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물물교환으로 그 가치를 물건 및 상품의 상대적 희소성에 기초하여 그 가치를 매겼고 교환하였다. 이후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거래량이 폭증하며, 돈(화폐)을 대신하여 조개껍데기, 짐승의 뼈·가죽, 보석, 옷감, 농·수·임산물 등을 이용하였다. 이후 특히 금, 은, 그리고 소금 등이 그 교환의 가치를 대신하였고, 현재는 금속을 활용하거나 특수한 종이를 이용한 종이화폐를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는 각 국가마다 일정한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거래를 위해서는 일정한 화폐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를 기축통화라 한다.
먼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통화 발행 국가의 압도적인 군사적·외교적 영향력·금 보유량, 금융업이 발달한 첨단 금융 시장이 존재해야 하고, 국가의 신용도와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조건들을 가장 잘 충족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금(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자국의 화폐가치 하락으로 대체 통화기능을 수행)을 기축통화라고도 보며, 유로화, 엔화, 파운드를 준기축통화(위안화:국제적 거래량 증가시)로 보고 있다.
대항해의 시대(15~17C)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계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 무역’이었다. 돈 특히 기축통화의 역사도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가장 먼저, ‘고대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인도와의 무역에서 향신료나 비단 등을 구입하는 결제대금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원나라 교초’는 원나라 조정이 보유한 일정량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로 화폐의 역할을 하였고, 고려나 그 밖의 몽골제국의 번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의 솔리두스 금화’와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 공화국 두카트 화폐’도 당시의 기축통화로 통용되었다.
지중해 무역에서 벗어나 대항해시대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며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 발견과 개발을 계기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되었고, 은 채취를 위한 신기술 ‘수은-아말감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는 은 채취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져 150년 만에 1만 60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은을 스페인은 차지하였고, ‘스페인 은화’는 물량 공세로 17C 후반까지 유럽 역내에서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었다.
당시 포토시 은광이 발견된 후 스페인 사람들과 인디언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원지대로 몰려 들었고, 4년도 지나지 않아 포토시는 ‘뉴스페인’ 전체 은 생산량의 두 배를 생산하게 되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에 임시 야영지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시기 런던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발 4000m의 황량한 고원지대로 몰려들었으며, 인류역사상 가장 최단 시간에 최대의 인구가 이 광산 일대에 집결되었다고 한다. 이에 감격한 카를 5세는 이 도시를 ‘제국의 도시’(imperial city)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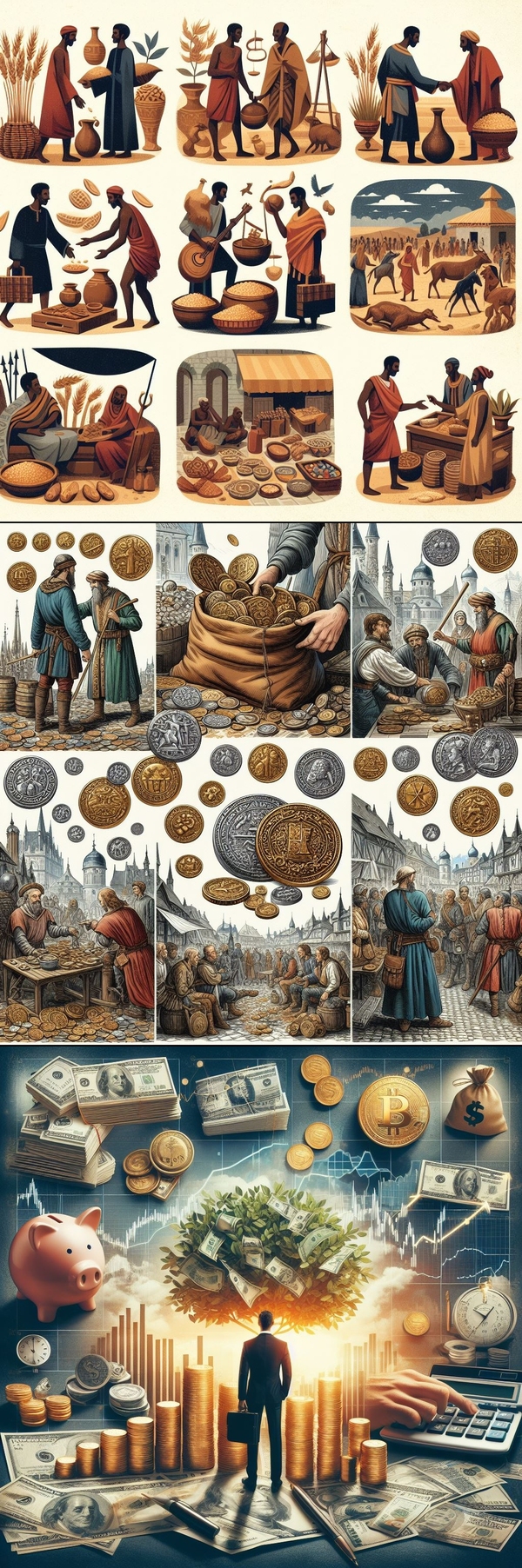
16세기 후반, 포토시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스페인에 부를 안겨주었고, 포토시 은광이 전성기일 당시 도시 인구는 16만 명에 육박하는 등 당시 ‘최대 번성한 도시(?)’였다.
비슷한 시기 동양에서는, 중국 명나라가 은을 납세기준으로 하는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시행하면서 스페인의 포토시 은이 대량으로 유럽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중세부터 18C 초반까지 서양 각국은 중국에 엄청난 양의 은을 주고 차, 비단, 도자기 등을 구입했다. 그 규모는 ‘르네상스 시대 부의 축적’의 시대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래량이었다. 유럽 각국은 중국 도자기 컬렉션이 열릴 정도로 열광하였고, 이로 인해 ‘유럽의 은’은 중국으로 순유출되었다. 중국으로 은 유입이 많을 때는 유럽발 중국행 선박의 90%가 중국에 대금으로 지불할 은괴를 선적했을 정도였으니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이 도자기를 독자 생산하게 된 18C 초중반까지 이어졌다.
18C 후반, 산업혁명으로 성공한 영국은 막대한 부를 쌓아가게 되고, 영국 또한 중국산 특산품에 대한 무역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으로의 은 유출량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동인도 회사와의 부채 대납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영국 정부의 빚은 천정부지로 많아져 영국 본토의 토지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지며 결국 영국 정부는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공장제 면직물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수로 찍어낸 수제 면직물보다도 가격경쟁력에 밀리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결국에 영국은 인도산 아편이라도 팔아서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메우려 했고, 이는 중국과 영국의 ‘아편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동양의 마지막 보루였던 중국의 패배는 서구 열강들의 개방요구와 함께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 시기 조선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즉 우리의 ‘돈의 역사’, 아니 ‘돈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그 결과는, 우리 역사의 하나의 오점이 된다.
‘돈에 대한 환상과 돈에 의한 비극 그리고 돈을 위한 욕심’은 자본주의에 의한 제국주의로 정당화되어 식민지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곧 ‘돈, 치욕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돈과 인간에 대한 개념 및 사회 통념상 의미는 어떠한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우대를 받는 것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혜와 덕이 아니라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인간은 부와 권세를 얻으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돈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권력’ 그 관계에 대한 상호 간의 존중은 ‘시소게임’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