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이이김김] 여덟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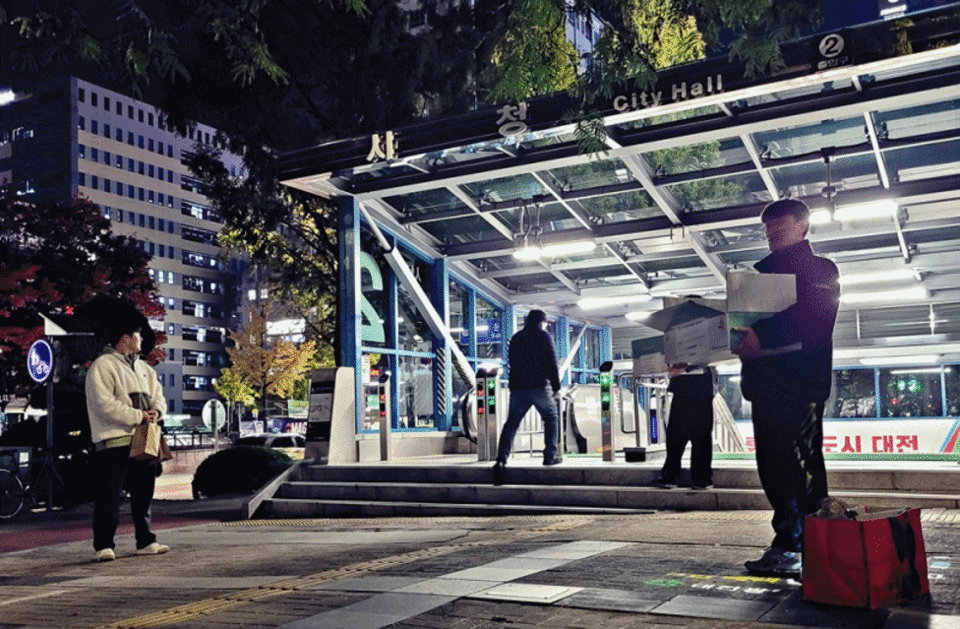
[월간 이이김김] 여덟 번째 이야기
거리에서 확인한 자영업의 오늘
...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지 않는다. ‘다음 달까지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연다. 불 꺼진 거리에서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김밥을 싼다. 그 작은 불빛이 도시에 남은 마지막 온기다. 그 온기를 느껴보기 위해 월간 이이김김 기자들은 하루 동안 자영업자가 돼 빵과 볼펜을 팔았다. 인도 위 작은 상자가 기자들의 가게였다.
#1. 시청역 앞에서 빵을 팔아봤습니다
- 발주부터 판매까지…빵 판매 체험기
▶본문읽기
#2. 지하보도에서 볼펜을 팔아봤습니다
- 추운 날씨만큼 쓸쓸했던 일일 장사기
▶본문읽기
#3. 소비, 망설임의 시대
- 참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는 소비자
▶본문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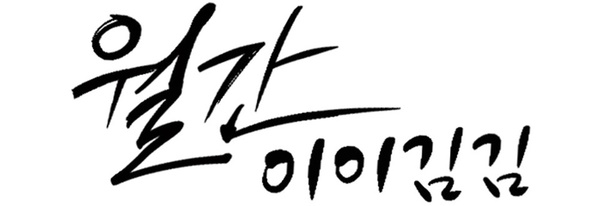
거리는 밝지만 그 불빛 아래엔 버티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손님이 뜸해진 가게마다 셔터가 일찍 내려앉고 하루의 마감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회복이 시작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치솟았으며 소비는 멈췄다. 살아남는다는 말이 유난히 무겁게 들리는 시대, 자영업자들의 하루는 오늘도 버팀의 연속이다.
불 꺼진 가게는 많고 다시 불 켜지는 곳은 드물다. 새로 단 간판이 한두 달 만에 철거되고 낯선 상호가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2.3%로 나타났다. 100곳이 개업하면 3년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곳은 52곳뿐이다. 소매·음식·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업종의 현실이다. 3년 생존율은 2022년 54.5%, 2023년 53.6%에서 해마다 떨어졌다. 1년 생존율 역시 2020년 78.4%에서 지난해 77%로 하락했다. 팬데믹이 끝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체력은 바닥이다. 숫자는 희망보다 절망을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 지급했다. 쿠폰이 풀리자 잠시 골목에 활기가 돌았다. 카드 매출이 오르고 주말마다 손님이 늘자 상인들은 숨통이 트이려나 했다. 그러나 반짝이었다. 쿠폰이 소진되자 점포 매출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정책은 체온을 올렸을 뿐 체질을 바꾸진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8%)보다 1.8%포인트 높았다. 특히 주거 물가가 5.5% 오르며 가장 크게 압박했다. 전기·가스·연료 7%, 수도·주거 서비스 4.3%, 유지·보수 4% 등 가계의 고정지출이 모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식생활 물가는 4.6%, 식료품 5.2%, 음식서비스 4%, 의류 2.9%로 나타났다. 의식주 전반의 상승은 지갑을 더욱 닫게 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질수록 외식과 여가 소비는 줄고 생필품 중심의 최소 지출만 남았다.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라 소비 자체가 위축된 구조적 침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때는 모두가 함께 무너졌다. 오늘의 위기는 다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는 버티지만 개인 상권은 한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외환위기가 국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위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매출이 줄었는데 임대료와 공과금은 오히려 올랐다. 물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며 원자재·식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 됐다. 최근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은 숨통을 더 조인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품목의 단가가 자동 상승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대량 구매가 어려워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 재료비가 오르자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는 감당하지 못한다. 가격을 낮추면 손님은 늘지만 수익은 남지 않는다. 버틴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의 인내가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회생기금, 생활안정자금, 재도전 프로그램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서류는 복잡하고 심사는 더디다. 지원은 있지만 속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 역시 금리 인하, 세금 유예, 전기요금 감면 등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버티는 건 개인의 체력이라는 하소연이 많다. 문을 닫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하루하루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모두의 표정은 지쳐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1만 명이라고 한다. 10년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도시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매출은 줄었고 희망은 옅어졌지만 사람들은 새벽에 문을 열고 밤에 셔터를 내린다. 수익보다 책임감이, 희망보다 관성이 그들을 버티게 한다. 이 위기는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내수가 얼어붙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인건비와 임대료가 동시에 오른 탓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지 않는다. ‘다음 달까지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연다. 불 꺼진 거리에서도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김밥을 싼다. 그 작은 불빛이 도시에 남은 마지막 온기다.

그 온기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 월간 이이김김 기자들은 하루 동안 자영업자가 돼 빵과 볼펜을 팔았다. 인도 위 작은 상자가 기자들의 가게였다. 낯선 손님과 마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버틴다’는 말의 진짜 뜻이 피부에 와 닿았다. 빵과 볼펜 판매로 22만 8375원을 벌었다. 준비 과정 지출은 13만 3000원이었다. 카드 수수료 1602원을 제외한 순수익은 약 9만 5000원. 여기에 한 선배가 숙고 끝에 식사비 7만 2000원을 자비로 부담한 덕분에 장부엔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기부할 수익이 남았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하루 동안 번 돈 전액을 대전청년내일재단에 기부했다. 작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짧은 장사 끝에 손에 남은 돈보다 오래 남은 것은 도시의 숨결과 사람의 체온이었다. 거리에서 만난 손님들의 말투와 표정, 뜻밖의 응원과 작은 오해까지 모두가 기록처럼 쌓였다. 기자들은 그 하루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도시의 삶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한복판에서 버티는 이들의 시간이 우리를 먹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