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중국산동사범대학 한국학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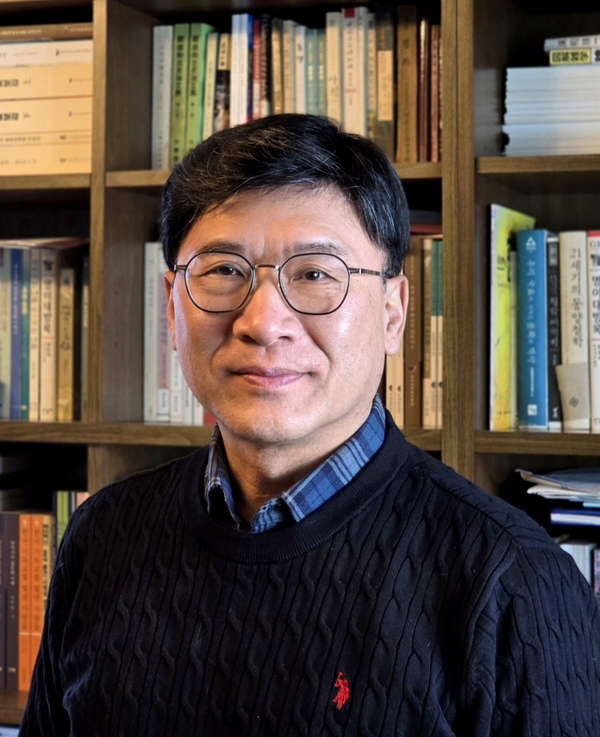
몇 해 전 전북 전주에서 효문화관련 학술대회가 있을 때의 일이다. 전주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전주만의 특징을 말하며, 또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온전한 고을’이란 뜻의 전주(全州)란 명칭의 특징을 거론했다. 물론 전주의 전(全) 자가 원래는 ‘집안으로 들여놓은(入) 옥(玉)’이란 뜻이고 그래야 ‘온전한 것’이라 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사람(人)의 왕(王)’이라 해석하며 군주사회에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지명이고 혹 잘못 썼다가 반역의 도시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주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나오면서 왕을 배출한 도시가 됐으니, 명실상부한 도시명이 된 셈이다. 이렇듯 전주란 명칭이 소중한 보배 구슬이 들어와서 온전한 고을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최고지도자가 나온 지역이란 의미로 더 많이 회자됐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함부로 쓸 수 없는 지명임은 분명하고, 중국내 한족문화권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전주란 지명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교수님, 중국에도 전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며 조용한 귓속말로 말해 주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 발표자인 제가 민망해 할까봐 조용히 전해준 것이다.
약간 당황했지만, “어느 성인지 아시나요” 물었더니 그것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면밀히 찾아보자 광서 장족 자치주 계림시에 전주현이란 지명이 나왔다. 계림은 경치가 아름다워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던 관광지 가운데 하나이고, 그 계림시에 속한 현 단위에 전주가 있었다. 물론 그곳이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장족 자치주이고 또 그 옛날 정치 행정의 중심지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유배지로 더 어울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전주란 지명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듯 같은 한자문화권 내에서 같은 지명을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주요 도시들의 명칭을 중국 지도상에서 검색해 보았다. 일단 충청도란 명칭을 탄생시킨 충주(忠州)와 청주(淸州)란 지명은 현급 이상의 도시에는 없고, 강소성 태주시 관할 진(鎭)급 단위에 청주란 마을이 있었다. 옛날 당나라 시절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최고지도자로 활약했던 산동성 청주(靑州)가 있기는 하지만 한자가 다르다. 그리고 충주란 지명은 현재는 없고, 중경시에 속한 충현(忠縣)이 옛날에는 충주란 명칭을 썼다고 한다.
한동안 충청도를 공주(公州)와 홍주(洪州)의 이름을 따서 공홍도(公洪道)라 부른 적이 있는데, 중국에 공주(公州)는 없고, 홍주(洪州) 또는 홍성(洪城)이란 지명은 강서성의 행정중심 남창(南昌)시의 옛 이름과 같다. 지금은 남창이라 부르지만 전에는 홍주, 홍성이라 불렀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서 깊은 도시였다고 하니 충청도의 홍성과 통하는 면이 있다.
다음은 대전(大田)과 세종(世宗)이다. 널따란 농경지를 가리키는 대전이란 명칭은 중국에 워낙 광활한 농지가 많아서인지 비교적 흔한 이름에 속한다. 드넓은 평원 지대인 절강, 복건, 사천성에서 현급 이상의 규모 있는 도시 형태로 대전이란 명칭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현 단위 이하의 기초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진(鎭), 촌(村), 향(鄕)에도 대전이란 명칭은 너무나 많다. 간혹 대전을 태전(太田)이라 불러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에 태전이란 명칭도 대전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있다.
끝으로 세종이다. 한마디로 중국에 세종이란 지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세종이 황제의 호칭이기 때문에 황제의 호칭을 도시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1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세종시란 명칭이 생겼다. 최근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가장 큰 치적 가운데 하나인 한글창제를 기념하며 한글문화 중심도시로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 하니 도시명에 걸맞는 일들을 주목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