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의 품처럼 …충청의 여린 맘을 보듬다

충남도청사가 철도에 따라 옮겨지면서 한밭이라 불리던 작은 농촌도시는 대전으로 발전했고 결국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는 등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발전의 축에는 물론 철도가 중요했지만 철도 이전에는 금강이 지나가는 자리 곳곳마다 금강이 만들어낸 너른 평야가 도시 발달의 원동력이었다.
금강은 충남지역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래가 깊고 충남도민들에겐 젖줄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충남학에 있어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충남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금강이 충남에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강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충남지역의 주요 자연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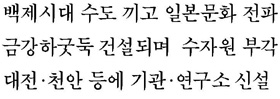
◆금강
금강은 유역 면적이 9885㎢, 유로 연장이 401㎞로 남한에서는 낙동강·한강 다음으로 긴 강이다. 본류는 전북 장수읍 수분리로 남쪽으로 흐르는 섬진강과 갈라져 진안고원과 덕유산 지역에서 흘러오는 구리향천(34㎞)·정자천(30㎞) 등 여러 지류들이 북쪽으로 흐른다.
전북지역의 북동부 경계 지역에 이르러 남대천(44㎞)·봉황천(30㎞)과 합류하고 옥천·영동 사이의 충북 남서부에서 송천(70㎞) 및 보청천(65㎞)과 합류한 뒤 북서쪽으로 물길을 바꾼다.
다시 갑천(57㎞) 등 여러 지류가 합쳐 충남의 부강에 이르러 남서 방향으로 물길을 바꾸면서 미호천(美湖川)과 합류하고 공주·부여를 지나 논산 강경에 이르러서는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며 서해로 흘러들어 간다.
소백산맥에서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상류지역은 높이 1000m이상의 산들이 진안고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덕유산(1594m)·백운산(1279m) 등 험준한 산들을 깎아 흐르는 많은 지류들은 무주의 구천동, 영동의 물한계곡 등 계곡을 이룬다.
중·하류에는 금산분지(錦山盆地)·보은분지(報恩盆地)·청주분지(淸州盆地)·대전분지(大田盆地) 등과 미호평야·논산평야 등 기름진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어 일찍이 우리 민족의 정착지 중 하나였고 백제문화의 본고장이었다.
하류지역은 서해안의 계속적인 침강으로 하구가 넓고 깊기 때문에 하항(河港)과 운하이용에 유리하다. 원래 금강은 호남평야의 젖줄로서 백제시대에는 수도를 끼고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으며 일본에 문화를 전파하는 수로가 되기도 했다.
금강 유역의 삼림대는 활엽수림군계에 속하고 있으나 소나무와 참나무가 주요 수종을 이루고 있다.
금강의 상류인 덕유산의 식물 군락은 고도에 따라 신갈나무·떡갈나무·단풍나무 등이 있고 중·하류 평야 지역의 식생은 소나무·곰솔·리기다소나무·일본잎갈나무·오리나무·아카시아나무·은사시나무 등의 조림지와 초지로 구성돼 있다.

◆금강이라는 명칭의 유래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금강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상류에서부터 적등진강(赤登津江)·차탄강(車灘江)·화인진강(化仁津江)·말흘탄강(末訖灘江)·형각진강(荊角津江)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공주에 이르러서는 웅진강, 부여에서는 백마강, 하류에서는 고성진강(古城津江)으로 기록돼 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금강으로 고착된 때는 백제 공주시대 때일 것으로 추측된다.
금강과 관련해 전해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곰과 관련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연미산에 살던 암곰이 산에 나무하러 왔던 남자를 납치해 그를 남편으로 삼았다. 이 남자는 산 아래 넓은 강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로 암곰은 넓은 강으로 물을 마시러 갈 적마다 눈독을 들였고 납치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자식이 둘 생겼을 무렵 동굴을 박차고 도망치고 만다. 남편의 탈출을 안 암곰은 두 아이와 함께 필사적으로 뒤를 쫓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연미산 기슭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흐르는 넓은 강의 물살은 제법 급하다. 용케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너는 남자를 향해 암곰은 “제발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는다. 그러나 남자는 암곰의 절규를 뒤로하고 강나루 숲 속으로 사라지자 암곰은 두 아이를 양팔에 끼고 넓은 강의 급류 속으로 뛰어들고 만다.
곰이 뛰어든 강이라 해서 고마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주변 나루터를 고마나루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이후 고마의 끝 모음이 줄어들면서 곰으로 바뀌었고 고마강은 곰강, 고마나루는 곰나루로 변했다. 또 곰을 한자로 옮길 때 공(公)으로 적어 그 지역을 공주(公州)라고 불렀다.
이 전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들에 따르면 고마 또는 곰이란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위상 뒤를 지칭하는 말로 쓰일 수 있다. 고마나루의 본뜻은 도읍지 뒤편이 있는 나루로서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 훈(訓)을 이용해 ‘곰 웅(熊)’자를 썼고 음(音)을 이용하여 ‘비단 금(錦)’자를 썼다. 따라서 금강(錦江)이란 강 이름은 곰이나 비단과는 관계없이 뒤쪽에 있는 나루, 곧 고마나루가 위치한 강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자원으로서 중요한 금강
백제시대 때부터 금강은 방어선의 역할도 했지만 물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졌다. 때문에 백제는 금강을 중심으로 부여의 규암평야, 논산천 유역의 강경∼논산평야와 같은 넓은 평야를 갖고 전국 최고의 곡창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당 평야는 큰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심각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금강은 편리한 수운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특히 강경천은 여름철에는 홍수로 인한 범람으로 가옥 피해도 커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강이 범람하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조치가 취해진 것은 1980년 대 들어서다.
늘 장마철만 되면 금강이 범람했는데 이에 대규모 댐을 통해 금강의 물을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지난 1980년 대전의 신탄진 부근에 대규모 다목적댐인 대청댐이 건설됐다. 대청댐은 당초에 홍수 방지와 관개용수의 확보를 위해 건설한 것으로 댐으로 인해 금강물의 이용량은 늘어나게 됐다.
특히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할 정도로 인구가 늘고 인근 천안과 청주 등의 도시 역시 크게 성장하면서 각종 용수의 수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댐은 이들 도시의 상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막중해졌다. 때문에 금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대전과 천안은 금강없이는 지금과 같은 크기의 도시를 유지할 수 없다.
이후 1990년에는 금강하굿둑이 건설돼 금강은 수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금강은 충청지역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북 진안의 용담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과 부안 앞 바다의 새만금 간척사업 역시 금강없이는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되기 힘들다.
금강 물을 공급받는 지역인 대전과 천안, 청주, 전북 군산 등은 정부의 각종 기관, 연구소, 공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등 가장 급격히 변모하고 발달하는 지역이 되고 있어 금강은 지역 발전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자료 충남학의 이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