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가 묻어나는 그곳, 기호유교 정신의 텃밭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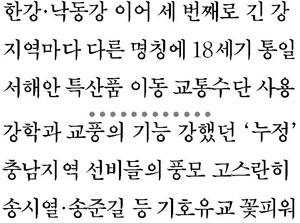
충남의 젖줄인 금강문화는 내포문화와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본다.

금강은 397.79㎞의 길이에 총 유역면적은 9912.15㎞에 달하는,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길이가 긴 강이다. 발원은 전북으로 이곳에서 북서 방향으로 흐르다가 대전에서 갑천과 만난 후 충북에서 서남쪽으로 틀어 충남지역으로 유입된다.
금강은 물리적으로 명확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포문화와 비교했을 때 정확히 구역을 나눌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금강의 각 유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금강은 공주에서 웅진·웅천·웅천하·웅진강으로 불렸고 부여에서는 사비하·백강·기벌포·백촌강 등으로 서술됐다. 때문에 금강문화는 각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금강의 명칭을 정리했는데 15개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다 18세기 말에 발간된 ‘연려실기술’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명칭을 금강으로 통일했다. 조선 말기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서도 다른 지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북에서 발원돼 서천 바다로 향하는 강을 금강으로 칭했다.

◆뱃길로 사용된 금강
내포문화가 배를 바다 건너 선진문물의 유입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금강문화는 서해안의 특산품을 이동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특히 과거의 전통시대에는 하천의 개념이 교통로였기 때문에 하천이 가지는 기능은 상당했다.
금강은 하구가 넓고 내륙수운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철도 등 육로교통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강경까지 큰 배가 자유로이 운항했다. 부강까지는 작은 배로도 이동이 가능했다. 때문에 금강은 내포의 특산품을 이동시켜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내포의 특산품 중 하나인 소금이 금강을 통해 대전 인근의 부강까지 오갔다. 금강수로는 중류 이하에서 경사도의 편차가 심하지 않고 하폭의 변동 또한 크지 않아 이 지역에는 포구와 나루 여울이 많았다.
포구의 경우 충남 각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잇는데 현재 ‘XX진포’, ‘XX포구’가 바로 그것들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명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논산 강경포구로 서해안의 특산인 소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지역이었다.
때문에 강경은 청주 등 충북지역에도 소금을 유통했고 이 곳에 배가 들어오는 날에는 장시가 들어섰다. 소금이 내륙까지 유통되면서 강경은 젓갈 종류를 많이 담갔다.
포구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배의 도하처 말고 자연적으로 수심이 얕아져 생기는 여울, 즉 탄(灘)도 금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덕의 신탄진, 공주의 와탄, 가덕탄 등이 대표적이다.
내포문화가 물길을 선진문물을 유입할 수 있는 매개, 개방적인 성격으로 이용했다면 금강문화는 하나의 교통수단, 내포문화에 비해 폐쇄적인 성격으로 이용했다.
◆강학과 교풍의 중심 금강
금강을 통해 내포지역의 특산품이 들어오고 바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길이 느려지면서 생긴 금강문화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누정문화이다. 금강이라는 뱃길로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너른 평야에서 생산되는 곡물 등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서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지역에 정자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는 자연스레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택리지로 유명한 이중환은 ‘금강에 정자가 많이 세워졌다’면서 그 이유로 ‘뱃길이 좋아 경치가 좋은 곳에 전망하기 좋다’고 서술했다.
당시 금강에 정자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오강팔정(五江八亭)’이라는 말도 생겼다. 금강의 뱃길은 바닷길에 비하면 느리지만 한강 등 다른 지역의 강과 비교했을 땐 상당히 빨랐다고 한다. 즉 금강에는 어느 정도 여유로움이 생기면서 이 같은 문화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금강의 정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용도는 물론 학술 등의 모임을 하는 장소로 이용됐다.
각 누정의 주요기능이 실린 ‘금강변누정 조사개요’에 따르면 대전 등의 누정에 대해 ‘휴식, 교류, 강학, 교풍(矯風)’의 목적으로 쓰였다고 기록했다. 다른 지역의 누정들 역시 휴식과 교류로 쓰였지만 충남지역의 누정은 주로 강학과 교풍의 기능이 강했다.
‘충청도읍지’에는 금강에 위치한 누정들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기록에 따르면 “부여현 서쪽 5리에 송시열이 여덟 글자를 새겼다. 글자가 새겨진 자리에 환문암이라는 누정이 생겼지만 지금은 무너졌다. 이에 효종대왕이 송시열의 글씨를 보존하기 위해 또 다른 누정인 대재각을 세웠다. 대재각은 송시열을 비롯한 북벌의 중심인물들이 많이 찾았는데 이곳에서 이들은 강학을 하고 시국을 논하며 글을 지었다”고 했다.
다른 구절에서는 “논산의 임리정이나 팔괘정 등은 노론의 강학처로 사용됐다”고 서술했고 “정수루라는 누정은 파평 윤 씨 종학당의 부속건물로 강학의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고 했다.
충남에서 누정은 단순히 휴식과 양반 자제들 간의 교류터가 아닌 충남지역 선비들의 풍모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금강의 일부 누정은 나루터의 창고로 사용됐으며 관원이 세금을 받으며 순찰임무를 하는 기지 형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기호유교의 발원지
금강이 강학과 교풍을 중심으로 한 누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학문에 꿈을 꾼 이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호유교문화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금강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 역사에서 충분히 주목되는 지역이다. 우리 역사에서 유교가 시대를 주도한 것은 여말 때 성리학의 도입 이후부터이다.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가장 앞섰던 이는 보령 출신의 백이정으로 이들의 뒤를 이은 이들이 바로 이곡과 이색부자를 비롯한 한산 이 씨 가문들이다.
이들은 서천 한산 출신으로 금강하류에 터를 잡고 살았던 가문이다. 내포문화와 금강문화의 접점지역에서 전진성리학이 발달한 것이다. 이후 이존오, 길재, 박팽년 등이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로 이들은 모두 금강유역에 연고를 뒀다.
16세기 들어서는 계룡산의 박증, 김정, 이자, 서기 등 유성지역에 거주했던 이들이 선배들의 뜻을 이어갔고 조선후기 들어 유학을 주름 잡았던 기호유교의 대부 격이 되는 김장생과 그의 수하생인 김집,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윤선거 등 역시 논산을 비롯한 회덕 등에 거주하면서 금강에서 기호유교의 꽃을 뿌렸다.
당시 기호유교를 학문으로 배웠던 사림의 분포를 보면 38명 중 17명이 충청 출신이다.
이 중 금강유역에 거주하면서 학문 정진에 앞장섰던 선비들의 수는 무려 13명이나 된다. 이후 18세기 들어 기호유교는 남한강 유역과 내포지역까지 전파됐고 내포지역의 기호유교문화생들 역시 호락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었다.
결국 조선 후기를 지탱했던 학문인 기호유교는 내포지역을 통해 도입됐다가 금강문화에서 복합적인 이유로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