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볼까, 선비들 마음 다스리던 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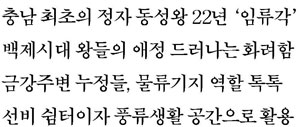
한반도에도 금강을 비롯해 한강 등 강 주변에 국가들이 들어섰고, 저마다 특유의 문화를 발전시켜나갔다. 이 중 금강지역은 다른 강 주변과는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강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누정문화이다. 누정은 단순히 쉼터의 목적을 지닌 동시에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곳이었고 예학이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섰을 때 나랏일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동시에 금강은 배를 이용한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관리들이 상인들의 물건을 담당하는 하나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충남만의 누정 문화를 살펴본다.
◆백제의 화려함의 상징
금강유역은 백제시대에 두 차례 도읍이 세워졌기에 예부터 누정이 많이 존재했다. 충남지역에서 최초의 정자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2년조에 보이는 임류각이다. 기록에 따르면 ‘봄에 궁궐 동쪽에 임류각을 세웠는데 높이가 5장이었다. 또 못을 파고 진기한 새를 길렀다. 간하는 신하들이 항의해 글을 올렸으나 대답하지 않고 다시 간하는 이가 있을까 염려해 궁궐 문을 닫았다고 했다. 또 임류각을 매우 아껴 시간이 날 때마다 동성왕은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록에서 동성왕은 신하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궁궐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는 임류각이 당시로선 초호화로 지어졌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뒤에도 누정 사랑은 계속됐다.
같은 기록 무왕 35년은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에서 물을 끌여들었으며 네 언덕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方丈仙山)에 비겼다”고 서술됐다. 이는 바로 망해루로 무왕이 매우 아꼈다고 전해진다. 무왕 37년에는 ‘가을 8월 망해루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누정에 대한 기록은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 때에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6년에는 “봄 2월 태자궁을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수리했다. 왕궁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는 백제가 멸망한 뒤 망국의 왕인 의자왕을 깎아내리기 위한 과장이 조금 보태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백제가 과거부터 누정을 굉장히 아꼈다는 것은 부인하긴 힘들어 보인다.
기록에 있는 누정 말고도 백제 때 지어진 누정은 관련 설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29년 간행된 부여지에 ‘부소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백제시대에 송월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건물은 이미 없어졌다. 군수가 임천군의 관문으로 쓰던 2층 건물 개산루를 그 터에 옮겨 세우고 사자루라고 불렀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를 유추해보면 송월대 근처에 이미 누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루터와 창고 등 물류기지 역할의 누정
백제시대 때 지어진 누정들이 화려함으로 인해 왕들의 휴양소 개념이었다면 이후 지어진 누정들은 물류기지같은 역할을 했다.
1933년 간행된 연기지에는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합강정은 오강팔정 중 하나로 예부터 논산과 강경 두 포구의 상선들이 다니면서 반드시 나루세를 바쳤다’고 실려 있다. 연기지에 실린 팔정은 합강정 이외에도 독락정, 한림정, 탁금정, 금벽정, 사송정, 청풍정, 수북정 등으로 이곳 모두 나루세가 존재했다.
부여 부소산성 안에는 백제시대 군창터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이 지역에 창고가 많이 들어섰다, 해당 창고들은 백마강가에 있어 전망도 좋았다는 이유로 현감들이 창고 옆에 좌기청(左起廳)으로 정자를 지으면서 충남의 누정은 물류기지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됐다. 이 곳은 물건을 싣기 위해 많은 물건들이 금방 쌓이곤 했기 때문에 물류기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상인들 역시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는 언제나 인파들이 몰려있었고 이들이 대기하는 별도의 정자도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학자인 청하언이 지은 ‘청풍정기’에 의하면 청풍정이라는 백마강의 대표적인 누정이 세워진 이유로 ‘바위가 기괴하고 호수가 상쾌해 가히 명승지라 할 만하다. 이 곳에서 봄마다 환곡을 많이 실어 나르나 티끌이 많이 날려 불편했다…(중략)…온돌을 깔아 마당을 만들고 벽을 넓게 터 만들어 꾸며…(중략)…청풍정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곡식들을 배에 싣기 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풍이 있는 누정
금강 주변의 누정들이 다른 지역의 누정과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는 점이다.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며 나랏일을 걱정하는 등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특히 예학이 조선시대 정치의 중심에 섰을 때 사계 김장생의 제자들이 금강변의 누정에 모여 대사를 논의했다. 송시열과 김흥국, 인조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신, 신흠, 서성 등 율곡학파 1세대들은 백마강 북쪽에 있는 수북정이라는 누정에 자주모였다고 한다. 이들의 선배 격인 김장생 역시 자리를 함께 하며 나라 돌아가는 일을 논의했다. 수북정이 1세대들의 쉼터였다면 권상하와 윤봉구 등 2세대들은 규암면에 위치한 대재각에 자주 모였다.
누정은 또 백제시대 때에는 왕과 왕족들, 조산시대에는 선비들이 풍류를 읊는 장소로 애용되기도 했다.
‘삼국유사’ 남부여·전백제·북부여의 기록을 보면 “사자수 양쪽 언덕에 그림병풍 같은 곳이 있어서 백제왕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선비들의 풍류생활 장소로 사용됐다. 김흥국이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와 수북정 근처에 은거하자 신흠이 찾아와 ‘수북정팔경(水北停八景)’을 지어줬다. 그 가운데 마지막 시를 통해 ‘백제가 정치를 돌보지 않고 노래와 춤으로 날을 보내다가 망했지만 조선의 선비들은 정치에서 자유로와 한가롭게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흥국의 친구인 황신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인 황일호가 이곳으로 와 ‘백마강가’ 9장을 짓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여러 시인들이 망국 백제를 주제로 낙화암과 관련된 시들을 지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