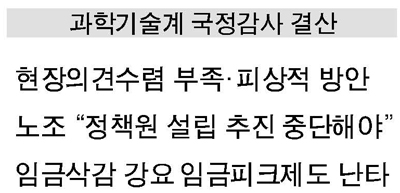
올해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에선 연구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R&D 혁신방안의 부실성이 도마 위에 올랐는가 하면 실질적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부실한 R&D 혁신방안
정부는 지난 5월 13일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와 그 지원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골자로 한 R&D 혁신방안 내놨다. 정부 R&D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란 점, 단기성과에 치중한 피상적인 방안 도출 등의 이유를 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출범하는 과학기술정책원에 대해선 강도 높은 반대가 이어졌다. 새로운 정책지원기구의 설립 여부는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사회적·범부처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지난달 25일 실장급 조직인 전략본부를 출범시켰고 정책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조는 “국회를 들러리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책원 설립을 강행하는 건 관료주의적 행태”라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전략본부 설치를 재검토하고 정책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임금 강제 삭감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노동개혁안은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직원 3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청년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은 원래 65세였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줄어든 뒤 계속 유지되고 있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침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결과적으로 출연연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효과는 없고 임금 강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국가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는 출연연 연구인력은 박사 학위자 비율이 높아 출발이 늦은 만큼 타 기관보다 근무기간이 짧은데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과학기술인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우수 인력의 이탈, 신규 우수 인력 유입 저하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 연령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70%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연구자의 정년을 61세로 정하는 건 연구성과 창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출연연을 지정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임금피크제는 우수 연구자의 이탈과 연구성과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맹목적인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출연연에 대한 임금 강제 삭감 강요를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