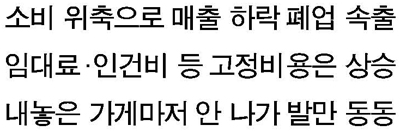
장사를 하다가 접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폐업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태부터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 빙하기’ 탓에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마지못해 장사를 접는 분위기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싶지만 폐업비용조차 아쉬워 휴업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점포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2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에 따르면 9월 말 지회에 등록된 외식업체 수는 1만 9377개로 8월 말(1만 9258개)보다 119개 늘었다. 업체 수는 늘었지만 이 중 휴업 중인 업체는 상당하다.
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는 등록업체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신장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폐업이 아닌 휴업을 하면 영업 중인 것으로 통계가 잡혀서다. 길거리를 지나다 흔히 볼 수 있는 ‘임대합니다’란 현수막이 이를 뚜렷히 증명해 주고 있다.
경기침체에 자영업자들은 휴업을 결정하고 점포 매수자를 찾아 나서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다. 대전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 모 씨는 “경기가 어려워 예전만큼 가게 운영이 힘들어 운영자를 찾아봤지만 매수자를 기다리다 월세만 지출할 것 같아 어떻게든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건물 업주가 아닌 이상 휴업을 결정해도 매월 임대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자금난에 허덕이게 된다.
외식업체들이 폐업을 택하는 것은 3대 법칙이 적용돼서다.
통상 요식업의 순수익은 총 매출에서 재료비 33%, 임대료·인건비·수도세·관리비·전기세 33%, 나머지 33%는 순수익이다. 가령 월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업주에게 돌아오는 돈은 33만 3000원이 되는 셈이다. ‘장사를 접고 차라리 월급쟁이가 되고 싶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매출이 두 배로 오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매출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반토막 나면 업주의 순수익은 제로에 가깝다. 음식이 덜 팔리면 재료비가 그만큼 적게 들겠지만 매출의 출렁임과 상관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은 고정적으로 나간다. 업주가 하루 종일 일해도 자신의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이다. 매출이 조금만 타격이 가해져도 순수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다 보니 장사를 접는 업주들은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에 등록된 업체들 중 8월 말 67개의 업체가 폐업했으며, 지난달 말엔 69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식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의 발걸음도 뜸해진 상태다. 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휴업을 선택한 이들이 가게를 시작할 때 들여다 놓은 기계들이 아까워서라도 매수자를 찾아 나서지만 경기침체로 이어가려는 사람이 없다”며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지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세월호 침몰 사태부터 시작해 메르스, 소비 빙하기 등 악재가 겹쳐 업주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우울한 현실을 전했다.
방원기 기자 bang@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