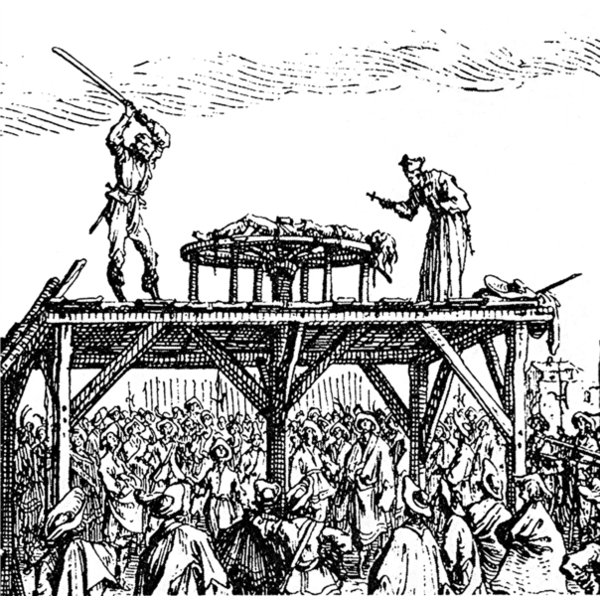
또 다른 물음을 던져보자. 만약에 이런 책자들이 신이 부여한 진짜 진리였다면, 시대가 변한 지금도 여전히 이런 교리의 룰을 반드시 지켜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찍이 이런 제도는 그리스도교 문화사의 한 켠에 자취만을 남기고 다 사라졌고, 후세인들에게는 문화사의 연구거리로만 존재하는 것을 보면, 절대화되고 관념화된 교리의 독단을 가지고 중세인들의 목을 조른 어리석은 짓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또 당시 인간들의 머리에서 풀려져 나온 생각을 언어의 틀에 넣고선 사람들을 옭아 맨 한 시대적인 종교현상으로 여겨진다.
결국 인간은 주어진 문화와 종교속에 살고, 사람의 생각도 감정도 모두 문화나 종교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런 '참회의 책자들'을 통해서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하나 언급하고 끝내자. 이런 벌 책자들까지 발행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옹 매듭으로 옭아 매었고 타인의 부부잠자리까지 컨트롤 했던 중세 이래의 그리스도교를, 오늘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부 가톨릭 사제들이나 주교들의 성추행(개신교 역시)에 대비시켜보면 참으로 씁쓸해진다.
이런 경우 독일은 참 독일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면서 부럽기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독일의 슈피겔(Schpiegel)지는 이런 문제를 한두 번이 아닌, 일어나는 사건마다 수 없이 적나라하게 다 파헤쳤다. 여기에 연루되었던 어떤 사제는 자살까지 한 사례들을 상세하게 보도했던 것을 한 기사에서 읽었다. 이런 음지의 기사를 파헤쳐 바깥으로 알린다는 자체는, 한 종교가 정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바로 중세의 그리스도교가 그러하지 않았던가? 현재 유럽의 텅텅 비어가는 교회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종교는 보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죽어 갈 것이다. 반드시 자기 성찰이 동반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더러 늘 신선한 수혈도 받아야 한다. 위에서 내린 참회의 벌들을 움켜쥐고 마치 진리인 양 실행하면서 살아갔던 중세인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기에, 비교차원에서 오늘날 같은 종교에서 일어나는 성문제들도 한번 언급해 보았다. <출처:기독교사상 2019년 1월호> <끝>
※ 이번 글을 끝으로 2016년 5월부터 4년 여간 이어졌던 [양태자 박사의 5분 중세사] 연재를 마칩니다. 필자인 양태자 박사님과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