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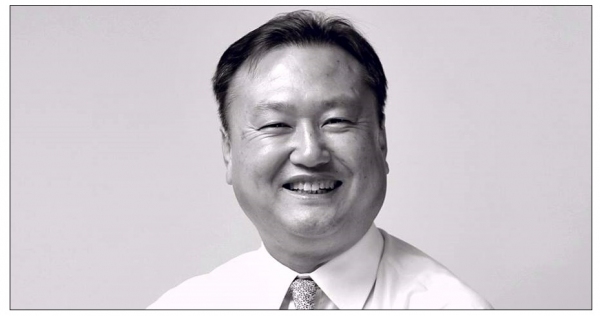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이것이 언론에 노출되면 온 나라가 들끓고 온 국민이 분노한다. 그러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진다.
이 언론 보도를 접한 국민은 혀를 차며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느냐?”고 한탄한다. 대개의 뉴스에서는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사나 교원단체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온다.
이 같은 뉴스를 시청하면서 나도 남들과 똑같이 분노한다. 하지만 일반 대중과는 조금 다른 나만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 우선은 이 뉴스가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균형감각 있게 작성됐을지를 생각해 본다.
또, 단편적 시각으로 상황을 점검했는지, 포괄적인 시각으로 살펴봤는지도 살펴본다. 용어의 사용은 적절했는지,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지는 않았는지도 지켜본다. 객관적 자세를 잃지 않고 뉴스를 점검해본다. 그러면서 몇 가지 느낀 바를 정리해 본다.
우선 언론이 보도하는 ‘교권침해’라는 용어는 ‘교사 인권침해’로 표기해야 문맥상, 법리상 맞다. ‘교권’과 ‘교사 인권’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교사 인권’은 교사가 천부적으로 갖는 인격체의 권리, 한 명의 국민으로 갖는 헌법상의 존엄한 권리를 칭한다.
반면 ‘교권’은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상 부여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권리’를 칭한다. 그러니 뉴스 내용으로 미루어 ‘교사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학생도 마찬가지여서 ‘학생 인권’이란 용어는 학생이라는 신분에 앞서, 한 인격체로서 갖는 고유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칭할 때 사용한다.
굳이 교사의 ‘교권’이란 말과 대칭해 사용할 용어를 고르자면 ‘학습권’을 쓰면 된다. ‘인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교권’이나 ‘학습권’은 법률상의 권리이다. 그러니 교권과 대치하는 말로 ‘학생 인권’을 사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뉴스 보도를 접하면 교사가 역량을 다해 양심껏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교권’을 침해하는 대상이 오로지 학생뿐인 양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각종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교권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대상은 교육 당국(교육부와 교육청)이고, 다음은 관리자(교장과 교감)와 선배를 포함한 동료 교사라고 답한다. 다음이 학부모였고, 학생은 그보다 후 순위이다. 하지만 언론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만 유독 심각하게 반응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자기 뜻에 따라 다채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싶어 하지만, 교육 당국이나 관리자의 벽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날로 심해져 심각한 단계에 이른 지 오래다.
교권이 교사의 가르칠 권리인 수업권, 평가권, 지도권 등을 의미한다는 것을 되새기면 약자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강자인 교육 당국, 관리자, 동료 교사, 학부모 등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교사의 권위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학생의 권리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음도 인정한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교사의 권한은 약화했고, 학생의 권한은 강화됐다.
수직적 위계질서가 냉혹하고 가혹했던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재단하면 안 된다. 같은 인격체로서 교사와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교사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도 중요하다.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습권’도 중요하다. 양자는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