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과 입학한 책 좋아하는 소녀였지만
좋아하는 것과 공부는 다르다는 것 깨닫고
진정한 꿈 찾아 10년 동안 여러 경험 쌓아
공익활동에 보람 느끼고 지금의 남편 만나
그래픽디자인 눈 뜨기 시작해 새 꿈 찾아
청년주간 공식 포스터 응모해 1등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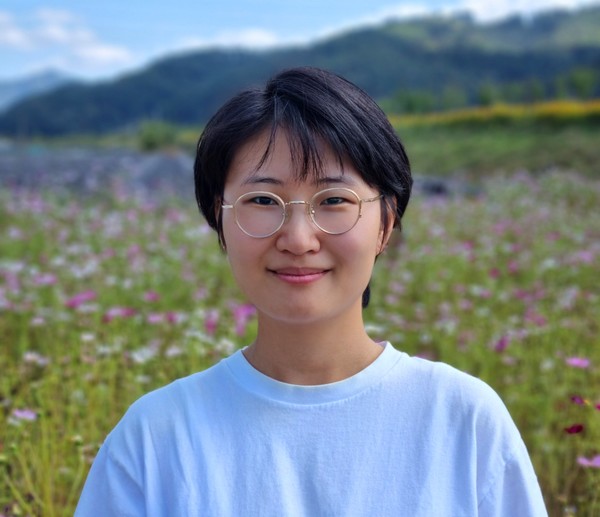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으로 많은 것을 배운다. 어렸을 땐 바르게살기 등을 통해 사회의 기본적인 통념을 배우고 도덕이란 과목에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심오한 이론을 공부한다. 그리고 대학교 혹은 사회로 진입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든, 대학교에서 학문을 더 쌓아 사회로 나서든, 초년생에게 사회는 굉장히 어색한 곳이다. 12년, 혹은 그 이상을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효빈(30·여) 씨도 그랬다. 고고학을 전공한 독서를 좋아하는 소녀가 삶의 이정표를 찾지 못하다 결국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선 걸 보면 우리는 청년이 꿈을 좇는 과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 문학소녀에서 고고학의 길로
김 씨의 전공은 조금 생소하다. 고고학과란다. 고고학이란 전공은 충남대학교를 비롯해 전국에 단 3곳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하다. 인류고고학과 같은 다른 전공과 융합한 학과까지 포함하면 9곳으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10곳도 안 되는 희소성이다. 김 씨가 고고학에 관심을 가졌던 건 그의 많은 독서량이다. 독서를 통해 역사를 습득하고 유적과 유물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서 고고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실제 이론을 공부하는 건 매우 다르다. 그 역시 고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그는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고학의 매력에 빠져 충남대에 입학했고 실습도 나가며 고고학자에 대한 꿈을 키웠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게 일이 됐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시작됐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길로 평생 먹고살아야 하는데 정말 이게 내 길이 맞느냐는 생각이 점차 커졌어요.”
◆ 졸업 후 찾아온 방황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긴 했지만 그의 목표는 확실했다.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해보자. 그래서 그는 정말로 다양한 일을 했다고. 글씨를 참 예쁘게 써서 손글씨를 제작해 팔아봤고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라지는 이웃 가게를 보며 공익활동에도 뛰어들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별의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단다. 그렇게 그는 졸업해 사회로 진출했고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공익활동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문제는 생활비. 대전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50만 원씩 여섯 달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 덕분에 공익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남편의 일을 어깨 너머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익활동에 이를 접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대전청년주간의 포스터를 공모한다는 내용을 접했다.
“졸업 이후 공익활동에 큰 기쁨을 느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으로 변모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디자인회사도 창업했죠. 그러다 청년주간 소식을 접해 한번 응모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응모했는데 덜컥 1등이 돼 버렸어요.”

◆ 청년의 방황 줄어들길
자신과 맞는 직업을 찾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지만 김 씨는 하루하루가 행복이다. 사랑하는 남편과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매일 붙어있고 여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다. 고고학을 뒤로 한 김 씨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공익활동에 디자인을 어떻게 입힐지 고민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찾은 것인 만큼 행복을 느끼면서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모습을 갖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지속가능을 위해 청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꿈을 찾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회로 진출하고 나서도 방황했던 만큼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들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도전이 좋은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진정한 꿈을 찾아 방황하는 게 어찌보면 청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게 김 씨의 지론이다. 우리가 청년이 꿈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우리의 미래인 청년은 대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전은 교통이 좋아 다른 지역으로 인재를 뺏긴다고 하지만 이면으론 교통이 좋아 대전으로 몰려들 수 있게도 할 수 있단 뜻이에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발굴되고 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면 청년은 우리 지역을 먼저 찾아올 거예요.”
김 씨는 10년 만에 자신의 꿈을 찾았다. 이 꿈으로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한 작업에 나섰지만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김 씨에겐 걱정은 없다. 10년 동안 찾은 꿈이 제시하는 이정표가 있기 때문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